미술관에 간 붓다
- 저자
- 명법
- 출판
- 나무를심는사람들
- 출판일
- 2014.06.25
0. 머리말 - 이것은 예술입니까?
인도의 전설 중 호랑이 뼈로 호랑이를 만든 마술사가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이야기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해온다.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이다. 나르시스적 예술가의 원형인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진짜라고 믿지 않으면 예술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의식세계를 대표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만든 환영에 먹힌 인도 마술사처럼 가짜 현실이 진짜 현실을 지배하기도 한다.
이미지와 실제, 가상과 진상이 역전되는 사태는 사물의 이미지를 전유함으로써 그 사물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토템과 터부도 마찬가지이다.
마애불 :: 마애불(磨崖佛)은 암벽에 새긴 불상.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일본 등에 퍼져 있으며 수법도 양각(陽刻:浮彫) ·음각 ·선각(線刻) 등 다양하다.
대표적인 마애석불로는 세계 최대 크기의 바미안 석불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서쪽 125㎞ 지점에 있는 바미안 지방의 암벽에 새겨진 높이 52.5m와 34.5m인 두 개의 마애석불로 2∼5세기경 쿠샨 불교 왕조 때 축조됐다. 그러나 이들 석불은 2000년 이슬람을 모독하는 유산이라는 이유로 당시 아프간의 집권세력이었던 탈레반 최고 지도자 모하마드 오마르의 지시에 따라 로켓 포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중국에도 4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둔황의 텐포동(千佛洞)을 비롯하여 텐티산(天梯山) ·마이지산(麥積山) ·윈강(雲崗) ·룽먼(龍門) 등의 마애석불이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흔한 불교미술양식이다.
전문가들은 마애불 양식이 2~3세기 고대 인도의 석굴사원 조영에서 시작됐으며 서역을 거쳐 중국,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본다. 인도 아잔타나 엘로라 석굴사원의 경우 거대 암벽을 파 수행공간을 만들면서 내부 벽면에 부처나 불교적 도상을 새겼다. 초기엔 석굴벽에 부처의 일대기와 전생설화 등을 넣었다가 점차 불상을 새기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마애불은 7세기를 전후해 충청도 해안지방에 처음 나타났으며,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과 태안 마애삼존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애불 [磨崖佛]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미륵불 :: 리 나라에서는 이 미륵불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되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다.
그때의 이 세계는 이상적인 국토로 변하여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8만4000세나 되며, 지혜와 위덕이 갖추어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에 케투마티(Ketumati, 鷄頭末)라는 성이 있고 이곳에 상카(Sankha)라는 전륜성왕이 정법(正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에는 수많은 보배들이 길거리에 즐비하지만, 사람들은 이 보배를 손에 들고 “옛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지.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을 탐하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 미륵이 수범마와 범마월을 부모로 삼아 태어난다. 그는 출가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에 걸쳐 사제(四諦)·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법문을 설한다.
그리하여 1회에는 96억 인이, 2회에는 94억 인이, 3회에는 96억 인이 각기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한다. 이것이 용화삼회(龍華三會)의 설법이다. 중생을 교화하여 이들이 진리에 눈뜨게 하기를 6만 년, 그 뒤 미륵불은 열반에 든다.
그런데 미륵불의 세계인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갖가지 노력이 요청된다. 즉,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을 독송하거나,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하거나, 지혜와 계행(戒行)을 닦아 공덕을 쌓거나, 부처님에게 향화(香華)를 공양해야 한다.
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깊은 자비심을 내거나, 인욕과 계행을 지켜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거나, 절을 세워 설법하거나, 탑과 사리를 공양하며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생각하거나,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공덕으로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이 미륵불신앙은 미륵불이 출현하는 국토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대하여 설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죄악의 종자와 모든 업장과 번뇌의 장애를 끊고 자비심을 닦아서 미륵불의 국토에 나도록 하자는 데 그 깊은 진의가 있다. 이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삼국의 불교 전래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널리 신봉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미륵삼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발원하면서 미륵불상을 조성하였고, 백제에서는 미륵삼존이 출현한 용화산 밑 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신라에서는 진자(眞慈)라는 승려가 흥륜사(興輪寺)의 미륵불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할 것을 발원한 결과 미시(未尸)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거나, 김유신(金庾信)이 그의 낭도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던 것 등은 모두 이 미륵불신앙의 긍정적인 일면이다.
반면에 후삼국의 궁예(弓裔)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칭 미륵불 행세를 한 것이나, 고려 우왕 때의 이금(伊金)이 미륵불로 자칭하며 혹세무민한 일, 조선 숙종 때의 승려 여환(呂還)이 자칭 미륵이라 하면서 왕권을 넘보았던 일 등은 모두 미륵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륵불 [彌勒佛]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세음보살 :: 산스크리트로 아바로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이며, 중국에서 뜻으로 옮겨 광세음(光世音)·관세음(觀世音)·관자재(觀自在)·관세자재(觀世自在)·관세음자재(觀世音自在) 등으로 썼는데 줄여서 관음(觀音)이라 한다. 관세음은 구역이며 관자재는 신역인데, 산스크리트 '아바로키테슈바라', 곧 자재롭게 보는 이[觀自在者]·자재로운 관찰 등의 뜻으로 본다면 관자재가 그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관세음보살로 신앙되어 왔으며 관음보살이라 약칭하였다.
그래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을 관음보문품(觀音普門品) 또는 관음경(觀音經)이라 일컫는다.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며, 관자재(觀自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觀照)하여 보살핀다는 뜻이다. 결국 뜻으로 보면 관세음이나 관자재는 같으며 물론 그 원래의 이름 자체가 하나이다.
보살(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성자(聖者)이므로 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제하는 보살[救世菩薩], 세상을 구제하는 청정한 성자[救世淨者],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푸는 이[施無畏者], 크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되게 하는 보살[大悲聖者]이라고도 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인도의 남쪽에 있는 보타락산(補陀落山)에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보타락산은 팔각형의 산으로, 산에서 자라는 꽃과 흐르는 물은 빛과 향기를 낸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형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버드나무가지 또는 연꽃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단독 형상으로 조성되기도 하지만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나타나기도 하며 지장보살(地藏菩薩), 대세지보살과 함께 있기도 한다. 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菩薩), 백의관음보살(白衣觀音菩薩),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 등의 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두산백과)
약사여래 :: 사여래(藥師如來)는 산스크리트어인 바아사쟈구르(Bhaisajya-guru)를 한역한 것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온갖 번뇌(煩惱)를 없애주며, 나아가 무지(無知)의 병까지 고쳐주는 등 인간 생활 전반에 이익을 주는 여래이다. 그래서 약사여래를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세이익적(現世利益的)이고 주술적(呪術的)인 성격이 강하여 일찍부터 그 신앙이 대중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아미타불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약사불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약사여래 신앙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 이후에 널리 신봉되어 수많은 약사여래상이 만들어졌다. 약사여래상은 왼손에 약단지를 들고 있어 다른 여래상과 쉽게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는 약사여래 (한국 미의 재발견 - 불교 조각, 2003. 12. 31., 솔출판사)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조성된 운문사 석조여래좌상은 겨우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뭉그러져 있다. 아마도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밤늦게 몰래 찾아가 만지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 조선 아낙네들이 불상의 코를 갈아먹은 탓일 것이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불상을 한갓 돌에 새겨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인 힘을 가진 영험한 존재로 생각했다.
가상과 진상의 경계를 뒤섞어 버린 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현대인들 역시 대중음악,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컴퓨터 게임 등 또 다른 이미지로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더욱 현란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에 매달려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의 현실적 요구를 뛰어넘어 다른 차원으로의 비상을 꿈꾸지도 못한다. 그들은 시적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날로 정교해지는 후기자본주의의 이미지 조작에 자신을 내맡긴 채 시시각각 변하는 이미지들 속에서 감각의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환영에 먹혀 버린 자는 인도의 마술사가 아니라 현대인들 자신이다.
미학은 서양 근대의 도구적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발했다. 미학이라는 근대적 학문이 만인대만인의 투쟁으로 와해되어 버린 현대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진실한 감정을 기를 수 있다면, 바로 그 근거는 사적 이익과 무관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감성적인 경험, 미학자들이 ‘무관심성’이라고 특징지은 감성적인 경험에 있다.
사물을 소유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삶을 변화시킨다. 불교는 실재를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이미지 너머의 초월적 실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불교는 이미지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하여 단지 이미지로서 바라보기를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선적인 관조는 미적 태도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무관심적 관조’와 유사하다.
불교예술 역시 붓다의 몸과 그의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불교예술의 이미지는 천 개의 강에 비친 달의 그림자이다. 그렇다고 달그림자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은 아니다. 왜냐하면 천 개의 강에 비친 달그림자는 하늘에 뜬 달과 함께 달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이 삶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존재함을 알리는 하나의 은유이다.
동정호 :: 호남성[湖南省] 북부, 장강[長江] 남쪽에 위치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 동정호는 산천이 아름답고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여 예부터 '동정호는 천하제일의 호수이다'라는 칭송을 들었음. 이백이 살았던 호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정호 [洞庭湖]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들뢰즈가 말했듯이 “(예술작품이라는)?하나의 기념비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감각들을 미래의 귀에 위임하는 것”이다.
예경(禮敬) ::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함.
출세간 :: ① 세속의 번뇌를 떠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름. 번뇌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 번뇌를 소멸시킨 깨달음의 심리 상태.
② 깨달음의 결과와 원인인 멸제(滅諦)와 도제(道諦). 사제(四諦)를 명료하게 주시하여 견혹(見惑)을 끊는 견도(見道) 이상의 경지.
[네이버 지식백과] 출세간 [出世間]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시공사)
1. 미소에 이끌리다

▶ 화순대리석불입상. 일명 벽라리민불 – 넓적한 코, 해맑은 눈망울의 석불입상은 소박하다 못해 자연으로 돌아간 촌로의 미소를 띠고 있다. 마을을 지키는 성황나무와 함께 들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석불은 농사를 짓다 새참을 먹거나 더위를 피해 찾아가면 언제든지 쉼터를 내주며 환한 미소로 반겨준다. 사찰 불상과 구별하여 흔히 민불이라고 부른다.
붓다의 미소
ο 릴케의 붓다
1902년 한여름 청년 릴케는 로댕에 관한 논문 집필을 의뢰받고 파리에 도착한다. 로댕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에게서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규명하는 법을 배운다. 로댕의 정원에서 릴케는 특이한 조각품 하나를 만난다. 바로 불상이다.
붓다
멀리서 이미 이방의 겁먹은 순례자는
그에게서 금빛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마치 회심에 찬 부자들이
은밀한 것을 쌓아 올린 것처럼.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상한 그의 눈썹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그것은 부자들의 술잔도
여인들의 귀걸이도 아니기에.
그 누가 말해 줄 수 있으랴,
얼마나 많은 것을 녹여
꽃받침 위에 앉은 이 형상을 만들었는지.
황금빛 형상보다 더 고요하고
더 차분한 누런빛으로
자신을 쓰다듬듯
주위 공간을 어루만지는 이 형상을.
ο 고통의 종교, 그리고 미소
불교는 고통의 종교로 서양에 소개되었다. 불교는 고통을 삶의 심오한 진실로 인정한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한다. 하지만 고통을 직시하는 일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도망치거나 합리화하며 거기에 머물기 십상이다. 틱낫한 스님이 다독여주듯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마음의 상처는 물론 이 세상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는 고통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고통을 묵살해서도 안 되지만 고통에 매몰되어 삶의 경이로움을 즐기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
불교 수행에서 ‘자리이타(自利利他)’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면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고통을 외면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화신인 대승보살은 끝없는 이타행을 실천하면서도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무아(無我)와 연기(緣起)의 이치를 깊이 자각하는 보살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고요한 마음의 행복, 그러므로 불교 수행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행복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다.
불상에서 흔히 보는 머리 위에 불쑥 솟은 육계(肉)와 미간의 백호(白毫), 온몸을 감싸는 후광, 발에 새겨진 만(卍)자 무늬, 젊은이의 용모 등 붓다만이 갖는 신체적 특징을 32상(相) 80종호(種好)라고 한다.
불상을 만든 장인들에게도 붓다의 정신성을 표현하는 일은 벅찬 과제였을 것이다.
그 간절한 그리움과 깊은 종교적 체험 속에서 불교예술이 발견한 것이 미소이다. 놀랍게도 고통을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설파하는 종교가 고통이 아닌 미소에서 자신의 상징을 찾은 것이다.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난 자, 열반(涅槃)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가질 법한 적정삼매(寂定三昧)의 고요한 미소를!
미소야말로 고통에 찌든 보통 사람과 붓다의 경계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표지이므로 붓다의 지혜와 자비, 그 감화와 구제의 힘도 가장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인 미소로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적멸(寂滅)의 즐거움’, 곧 미소는 불상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혹독한 수행을 나타내는 앙상한 몰골의 고행상조차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불교는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으로서의 고통이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으로서의 고행이든, 고통을 붓다를 붓다답게 만드는 자질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 과정에서 겪은 고통보다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강조한다. 불상은 오직 고통의 해소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표현한다.
ο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 서산마애삼존불 –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 주는 불상 중 하나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적 힘이 잘 조화되어 있으며, 백제인의 미적 탁월성과 창조성을 한껏 펼치고 있다. U자형의 옷 주름과 정면으로 드러나 있는 발가락이 인상적이다.

▶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을 보면 붓다는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따뜻하고 심성 고운 우리네 이웃처럼 보인다. 가운데 본존불의 해맑은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밝고 따뜻하고 개방적인지 느끼게 한다. 사진의 오른쪽에 명상에 잠긴 반가사유상마저 개구쟁이 같은 눈웃음을 짓고 있고 왼쪽에 보주(寶珠)를 받들고 있는 보살상은 실눈을 하고서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부드럽고 유연한 손은 피가 통하는 듯 사실적이면서도 편안하고 여유롭다. 눈가에 번지는 미소와 보조개까지 들어간 포동포동한 뺨, 밝고 쾌활한 그 모습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백제의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미소는 불상에 새겨진 미소 중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한 미소이다.
6세기 말에서7세기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산마애삼존불〉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적 힘이 잘 조화된 불상으로, 도상학적으로 남북조시기와 수대 중국 불상의 모티브를 차용하면서도 백제인의 미적인 탁월성과 창조성을 한껏 펼치고 있다.
자리이타 :: (1)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 대승의 보살이 닦는 수행태도로서, 오직 자신의 제도만을 위하는 성문(聲聞)ㆍ연각(緣覺)의 소승적 자리(自利)의 행과 구별됨. 자리란 자기를 위해 자신의 수행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이타(利他)란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리이타를 원만하고 완전하게 수행한 이를 부처라 한다.
(2) 사은 중 동포은의 상호관계. 곧 모든 동포 사이는 서로 자리이타의 관계로서, 상호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됨. 소태산대종사는 무슨 일이든지 행동에 옮길 때에는 자리이타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이롭게 하라고 했다. 이것이 곧 불보살의 이타적 대승행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리이타 [自利利他]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ο 우리 시대 붓다의 얼굴은?
『금강경』에서도 색이나 음성으로 붓다를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종교적 감성을 깊게 하는 불상이라면 좋은 종교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ο 근대적 몸 <생각하는 사람>

▶ 생각하는 사람 – 벌거벗은 채 바위에 안자 두 발을 모으고 주먹을 입가에 댄 채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인체의 비율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조각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큰 상체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그의 고뇌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한다.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전 우주를 능가하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파스칼이 지적한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유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세 또한 인간만이 취할 수 있다. 서양미술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예술 작품이 등장한 것은 조각의 역사가 시작되고도 한참이 흐른 뒤였다. 이탈리아 산 로렌초 교회 내부에 있는 메디치 무덤에 조각된 미켈란젤로의 〈생각하는 사람〉과 그의 불후의 역작 시스티나 성당 천장벽화 중 〈예레미야〉가 최초의 작품이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19세기에 이르러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크게 영향을 받은 로댕이 그 뒤를 이었다.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파리장식미술관에 전시될 기념문으로 계획되었던 〈지옥의 문〉의 한 부분이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의 『신곡』에서 주제를 따온 〈지옥의 문〉은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 기베르티의 조각 〈천국의 문〉에서 영감을 받았다. 로댕은 야심차게 이 작품을 추진했으나 끝내 완성을 보지 못했다. 결국 〈생각하는 사람〉은 1880년 독립적인 청동조각상으로 먼저 제작되었는데, 후에 자신의 무덤에 놓을 정도로 로댕이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은 작품이다. 최초에 붙여진 〈시인〉이라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형상인 동시에 로댕 자신의 자아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왼손을 왼편 무릎에 얹고 오른 팔꿈치를 왼편 다리에 받치면서 턱을 괴고 있는 이 조각상은 일반적으로 턱을 괸 자세와 달리 안정적이지 않다. 긴장한 채 앉아 있지만 그 어떤 자세보다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며 경직된 근육 위로 드러난 힘줄, 잔뜩 힘을 주어 움츠러든 발끝, 과장된 손동작, 의도적으로 비틀어진 자세는 직설적으로 그의 고뇌를 말하고 있다. 미술사학자 엘센(Albert E. Elsen)의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나 찌푸린 이마, 커진 콧구멍, 꽉 다문 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팔다리 근육과 등, 단단히 쥔 주먹과 긴장된 발가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신곡』 「지옥편」
지옥에 막 도착한 단테는 자신의 발아래 펼쳐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을 응시하고 있다. 그는 지옥불이 타오르는 압도적인 장관 앞에 몸을 떨며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 영혼들의 몸부림과 절규를 바라본다. 그는 단순히 지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지옥의 문〉 윗부분에서 아래의 군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는 시인이며 창조자이다. 로댕은 그의 작품 구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단테는 문 앞의 바위에 앉아 시를 구상하고 있다.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긴 코트를 걸친 마르고 금욕적인 단테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첫 번째 인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을 고안했다. 벌거벗은 채 바위에 앉아 두 발을 모으고 주먹을 입가에 댄 채 그는 꿈을 꾼다. 풍부한 구상이 점차 그의 머릿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며 이제 더 이상 그는 몽상가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개별적인 인간의 특징에 무관심했던 그리스 조각과 달리 로댕의 조각은 개인의 내면적인 고뇌를 표현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보들레르가 말한 ‘악의 꽃’처럼 타락해 버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참혹하고 엄숙한 내면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고뇌는 중세인의 종교적인 고뇌가 아니라 근대인의 고뇌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해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로 승격된 근대적 주체에게 생각함이란 세계를 자기의 방식으로 전유하고 지배하는 행위이다. 그에게 생각함이란 외부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바깥에서 지옥을 응시하는 자로서, 근육질의 단단한 몸은 철학자 김형효의 말처럼 “지옥 같은 세상을 혁파하려는 선의지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도덕적 의지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외부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움켜쥐려는 것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비극적인 힘이다.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가 ‘영혼의 감옥’인 물질로부터 순수한 영혼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면, 근대인 로댕은 도덕적 의지를 청동의 몸에 각인시키고자 한다. 푸코의 주장처럼 근대적 사유는 일종의 권력이다. 그것은 몸과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힘이다. 근대인에게 몸은 정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몸에 대한 서양 근대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도구적 합리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적인 인체의 아름다움에 열광했던 서양 예술이 오히려 몸에 대해 무지했던 사실은 이성적 사유가 얼마나 몸에 대해 폭력적인지를 잘 보여 준다.
ο <반가사유상>의 몸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국보 83호. 동양적인 얼굴에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지만 턱을 괸 손가락마저도 부드럽고 편안하다. 그는 무엇을 사유하는가?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78호(좌) 제83호(우) -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고뇌하는 표정도 없고 뒤틀린 자세도 없다. 근육질이 조금도 없는 마르고 유연한 몸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팔의 우아한 곡선에는 그 어떤 긴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반가상半跏像〉이라고 부르지만 이 조각상들이 취한 자세는 반가부좌가 아니라 느슨하게 다리를 얹은 유희좌이다.
동양적인 얼굴에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눈,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이 보살상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고뇌하는 표정도 없고 뒤틀린 자세도 없다. 그는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지만 편안하고 부드럽다. 근육질이 조금도 없는 마르고 유연한 몸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팔의 우아한 곡선에는 그 어떤 긴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턱을 괸 손가락마저도 부드럽고 편안하다.
현재 학계에는 사유상의 주인공이 미래불인 미륵보살이라는 주장과 태자 시절의 석가모니불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ο ‘나’를 비운 몸
붓다의 깨달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석가모니불의 태자 시절 선정(禪定)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팔 년간의 극한의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붓다는 수자타 여인이 준 우유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시작한다. 이때 붓다는 바로 태자 시절의 선정을 기억한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농경제에 참석했을 때 예민하고 사려 깊은 태자는 우연히 보습에 걸려 죽어가는 벌레를 보게 된다. 그는 벌레의 죽음을 목격하고 깊은 충격을 받아 생성과 소멸, 삶의 근본 원리를 사유했다. 그가 사유한 것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웬일인지 태자는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태자는 덧없이 죽어가는 벌레를 보며 자신의 고통인 양 아파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마음 깊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고통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고통은 뜬구름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 줄 알았던 몸이 지수화풍(地水火風)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몸은 정신을 가두는 감옥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단지 과거에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일 뿐, 생성된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소멸된다는 이치를 깨닫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절망이나 허무에 빠지는 대신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담담하고 고요해졌다. 변덕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자 구름 걷힌 맑은 하늘처럼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모든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태, 즉 일어남이 없으므로 사라짐도 없는 상태를 적멸이라고 한다. 이 경지는 언어나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운 상태이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과거에 느꼈던 즐거움과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즐거움이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멸의 즐거움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달리 영원한 즐거움이다.
우리는 음식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욕구의 충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 또는 상태를 소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밖에도 생리적으로 쾌적할 때에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이런 만족은 모두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어떤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 즐거움은 곧 고통으로 바뀔 것이다.
이와 달리 모든 느낌과 생각이 사라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에 기대어 발생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나 쾌적함에서 얻는 만족과는 전혀 다르다. 적멸의 즐거움은 조건이 없는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은 발생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한계가 없다. 사유상의 미소는 바로 이 적멸의 즐거움, 불생불멸의 즐거움을 보여 준다.
ο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태자 석가모니의 사유는 타락한 세상을 혁파하겠다는 적극적인 도덕 의지의 표현도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시인의 독창적인 상상도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발생하고 소멸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관조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생멸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라는 생각도, 나의 존재와 얽혀 있는 선입견도 버려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나를 비우면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온갖 무상한 것이 사라진다. 모든 생멸이 사라져서 적멸에 이르면, 비로소 조건 지어지지 않은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생각을 조작하거나 몸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또렷하게 인지하고 기억한다. 그것은 몸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한다. 여기에 몸을 대상으로 삼거나 영혼을 담는 집으로 간주하는 서양의 근대적 사유는 발붙일 곳이 없다.
동양 예술은 몸의 이상적인 비례나 균형보다 정신성에 더 가치를 둔다. 특히 얼굴의 모습은 마음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인체의 아름다움에는 무관심했다. 동양 예술가들은 외형을 닮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정신성을 담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수월관음과 선재동자
ο 천 개의 강에 비치는 달, 수월관음

▶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 1323년 서구방이 그린 이 그림에서 바위에 반가좌한 관음보살이 한쪽 무릎을 세운 채 합장하고 있는 선재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바수밀다 기녀와 비슬지라 거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선재는 다시 스승을 찾아 서둘러 길을 떠난다. 다음으로 찾아뵐 스승은 관세음보살이다. 선재는 남인도 해안가에 있는 험준한 바위산 보타락가산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남으로 향한다. 멀고먼 구도의 길을 따라 거친 바다를 건너고 험준한 암벽을 오르며 골짜기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
거기 시냇물 굽이쳐 흐르고 나무가 울창한 곳, 높이 솟은 바위 위에 향기로운 풀잎을 깔고 앉아 반가부좌한 채로 선정에 든 수월보살이 있다. 수월관음은 아미타불이 새겨진 보관을 높이 쓰고 있다. 화려하고 섬세한 무늬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옷이 어깨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그 위에 다시 투명하게 속이 비치는 비단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 수월관음의 온몸은 빛으로 감싸여 있고 투명한 수면은 그 빛을 되비추고 있다. 두 그루 푸른 대나무 사이로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꿈에서 깨어난 듯 선재를 응시한다. 관음의 시선이 향하는 맞은 편 물가에 선재동자(善財童子)가 관음을 우러르며 발을 쫑긋 세우고 합장하고 서 있다.
고려 불화 〈서구방필 수월관음도〉는 보살과 존재 자체의 만남이라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내면적인 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관음의 옆에는 일렁이는 파도와 수반을 갖춘 정병(淨甁)에 꽂힌 버드나무, 한 쌍의 청죽(淸竹)과 새 등이 묘사되어 있으나 그 모든 것은 고요하고 투명하게 화면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대각선 구도 속에서 압도적인 크기의 보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에 비하여 왜소하기 이를 데 없지만 선재동자는 이 그림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 다시 말해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비로소 발견하는 자이다.
그림 밖의 관람자는 선재의 시선으로 관음을 바라본다. 서양 미학에서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물이나 인공물 앞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숭엄하고 거룩한 느낌과 스스로 고양됨을 느낄 때 그런 미적 감정을 ‘숭고’라고 부른다.
고려 불화에 그려진 관음은 그 거대함이 숭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온 우주를 감싸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느껴진다. 동시에 선재의 눈으로 관음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거대한 관음 앞에서 선재처럼 모두 어린아이가 된다.
‘수월(水月)’이란 ‘물속의 달’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달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일시에 천 개의 강에 나타나듯이 보살의 청정한 법신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그 경계가 무한하고 보살의 자비가 온 세상을 고루 비추어 중생의 바람에 따라 제한 없이 평등하게 응함을 나타낸다.
고려 불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 모습을 선보이는 수월관음은 외딴 바닷가 적정처(寂靜處) 한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구제하는 존재이다. 관음의 서른세 변화신 가운데 하나인 수월보살은?『법화경』 「보문품」에 등장하지만, 고려 불화의 수월관음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 중 한 분이다.
수월관음은 그 독특한 도상적 특징으로 고려 시대부터 불화로 많이 조성되었으며 독존으로 모셔진 관음상의 대부분은 수월보살이다.
ο 관음 앞에서 모두 건재동자가 되다
『법화경』 「보문품」에 따르면,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뱃사공의 모습, 여인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등 서른세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어느 곳에든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음보살은 앉은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되며,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은 우리를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듯이 수월관음의 자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선재동자가 된다. 관음의 자비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든다.
그러므로 선재동자는 존재 자체의 순수성으로 돌아간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를 선재동자로 만드는 힘은 위압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공기처럼 우리 곁에서 지켜보는 자비의 힘이다. 그 자비는 약하고 미미한 존재의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춘 가장 강한 자의 자비이기에 우리를 어리광만 피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본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한다.
ο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 되다

▶ 백의관음도(좌)와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세부(중앙, 우) - 혜허 스님이 그린 고려 불화로 양류관음도. 일명 물방울수월관음도라고 불리운다. 일반적인 수월관음도가 암좌에 반가좌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수월관음도는 물방울 혹은 버들잎 형태의 광배 안에 서서 법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이다. 왼손에는 정병,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버들잎에 싸여 있어 양류관음도라고 부른다.

▶ 김우문필 수월관음도 – 1310년 고려 충선왕의 왕비인 숙비가 발원하여 김우문, 이계, 임순 등 여덟 명의 궁중화원이 그린 것으로 1391년 승려 료우겐이 경신사에 진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에서 가장 크고 기법이 뛰어난 명작. 수월관음보살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색채와 치밀한 문양 등에서 고려 화원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 준다.
하늘과 바다, 바위를 배경으로 한 관음은 화려한 궁전과 나무, 수많은 불보살로 장엄한 극락세계의 아미타여래보다 더 인간적이고 친밀하며 내면적인 순간을 반영한다.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대상도 없이 자연 속에서 그저 존재 자체와의 만남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나 지장보살과 시왕(十王)의 지옥에는 좋음과 싫음, 죄와 벌, 기쁨과 고통과 같은 인간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극락이건 지옥이건 그곳은 세계 내 존재들의 삶과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관음이 자리 잡은 바다로 둘러싸인 보타락가산, 구름과 암벽 사이에 앉아 있는 관음은 그런 인간적인 의미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는 존재 자체의 본래적인 모습으로서만 존재한다.
지옥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세계는 인간을 위압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고 오직 관음의 자비에 비하여 그것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 줄 뿐이다.
사천왕이 두려움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했다면, 수월관음은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두려움 없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한다.
자비로 감싸진 세계, 고려인들은 이렇게 온 우주가 자비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다. 저 어마어마한 숫자의 몽고군의 침입을 붓다가 막아 주리라 믿으며 전란의 와중에 팔만장경을 판각하였던 그들은 루카치가 고대 그리스를 일러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말한 것처럼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오로지 붓다를 믿을 수 있었던 고려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선재동자의 눈에 비친 관세음보살은 산보다 크고 거대하지만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볼 뿐이다. 그 순수한 내맡김 속에서 선재동자와 수월관음이 하나가 되고, 보는 자가 보이는 자가 되고 보이는 자가 보는 자가 되며,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이 하나가 된다
사천왕과 배트맨
ο 분노와 두려움의 미학

▶ 완주 송광사 사천왕 – 찌푸린 미간과 튀어나온 눈, 이글거리는 눈빛, 크게 벌리거나 꽉 다문 커다란 입,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험악한 얼굴과 우락부락한 몸에 창과 칼을 든 사방의 천왕이 도열해 있는 문은 삼엄하기 이를 데 없다.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은 1649년에 조성된 것으로 사천왕상의 변천사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 동방지국천왕(좌)과 서방광목천왕(우) - 비파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지국천왕은 붓다의 나라를 지키는 신이고, 눈을 부릅뜬 채 용을 안고 있는 광목천왕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 남방증장천왕(좌)과 북방다문천왕(우) - 보검을 들고 있는 증장천왕은 모든 생명을 기르는 신이고, 보탑을 지닌 다문천왕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가르는 경계이다. 어느 세계에 살든, 가 보지 않은 세계는 매력적이다. 문 안쪽의 사람은 문 바깥의 세계를 꿈꾸고 문 바깥의 사람은 문 안에 있는 세계가 궁금하다. 용기 있는 자만이 문을 통과하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출세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에 세 개의 문이 있다. 세계의 중심, 수미산의 기슭으로부터 중턱을 지나 정상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하는 구조물인 세 개의 문은 서로 반복되고 중첩되는 가운데 공간을 분할하는 동시에 소통시킨다. 세 개의 문은 물리적 공간만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연다. 문 없는 문, 일주문을 지나(사찰에 따라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금강역사가 지키는 금강문을 두기도 한다.) 사천왕이 지키는 하늘의 문인 사천왕문을 통과하여, 성과 속의 세계를 둘로 나누면서도 하나로 잇는 불이문(不二門)을 지나면 마침내 청정한 땅, 붓다의 세계에 도달한다.
문은 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지나가지 못한다. 하늘의 왕들이 눈을 부릅뜨고 손에는 칼을 들고 발로 사나운 악귀를 짓밟고 서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다. 바로 이들이 사천왕, 호세천왕(護世天王)이다. 그들은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가장 낮은 하늘에 거주하면서 불보살을 지키고 불법을 믿는 자들을 보호한다.
동쪽 하늘에 거주하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은 붓다의 나라를 지키는 신이다. 이 호세천왕은 놀랍게도 비파를 들고 음악을 연주한다. 용을 안고 있거나 포승줄을 들고 있는 이는 서쪽 하늘에 거주하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이다. 사실 가장 겁나는 눈은 부릅뜬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다.
남쪽 하늘에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이 살고 있다. 그는 보검을 들고 있으나 모든 생명을 기르는 신이다. 북쪽 하늘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보탑을 지니고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하지만 붓다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 이후로 그는 역할을 바꾸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을 구원하는 신이 되었다.
원래 사천왕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 야차들이었다. 그저 완력과 신통력을 자랑하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붓다였다. 붓다의 설법을 들은 후, 그들은 불법에 귀의하여 붓다의 설법이 행해지는 공간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을 지키는 호법신장(護法神將), 불교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사천왕의 힘의 원천은 분노와 두려움에 있다. 그들이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택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인 힘이다.
광목천왕과 다문천왕은 매서운 눈빛으로 멀리까지 지켜보고 있고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은 위협하듯 눈을 부릅뜨고 서 있으니, 그 어떤 삿된 것도 범접하지 못한다.
니체가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악마를 이기기 위해 악마성을 차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ο 현대판 사천왕, 배트맨

▶ 배트맨 -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법. 넌 적의 악몽이 되어야 해.” 무의식 깊이 각인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는 진짜 슈퍼히어로가 된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배트맨은 무술로 단련된 몸과 엄청난 재산으로 얻은 최첨단 과학기술 덕분에 슈퍼히어로가 되었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눈앞에 있는 악당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물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다.
“문제는 적이 아니야. 진짜 적은 네 안에 있어. 넌 너 자신을 두려워해.”
“네 분노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억눌린 힘이야. 이제 자신과 맞서야 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네가 두려움이 되어야 해.”
그를 진짜 영웅으로 만든 것은 마음의 힘이다. 무의식 깊이 각인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식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진짜 슈퍼히어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고담시의 부패와 악을 소탕하기로 결심한 후 라스 알 굴의 소굴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무술 수련을 할 때 그의 목표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모든 공포를 극복했을 때 그는 고담시로 돌아온다.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법. 넌 적의 악몽이 되어야 해.”
자신을 두렵게 했던 힘이 이제 적을 두렵게 하는 힘이 된다. 마키아벨리가 간파했던 것처럼 공포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제압하는 것도 없다. 공포는 인간을 얼어붙게 하고 힘에 굴종하게 만든다. 악당들은 선량한 시민을 겁주어 세상을 제멋대로 지배한다. 하지만 이제 배트맨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한다. 악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고담시의 평화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신이 적의 악몽이 되고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존재가 되고자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선량한 시민에게 ‘선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희망을 주기 위해 ‘선의 상징’이 되고자 했다.
〈다크 나이트〉에서는 ‘선 그 자체를 위한 선’의 반대편에 있는 ‘악 그 자체를 위한 악’의 존재와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보여 준다. 배트맨과 조커는 그처럼 순수하게 추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악을 상징한다.
배트맨 시리즈 완결편인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어둠의 감옥에 갇힌 주인공에게 탈출을 권하는 늙은 죄수의 입을 통해 다시 두려움과 희망을 말한다. 부질없는 희망이 가장 지독한 징벌이지만, 희망은 필요한 것이라는 주인공의 말을 통하여 감독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말한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늙은 죄수의 역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그 어떤 절박함이 있기 마련이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 때 바로 그 절박함 때문에 희망이 있게 된다. 이제 두려움은 한계를 넘어 길을 연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이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에게 새롭게 다가온 두려움은 고담시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절망으로부터 나온다. 『반야심경』에서 보살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지만 배트맨의 두려움은 타인을 위한 것, 그야말로 보살의 두려움이다.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는 전설적인 존재가 된다. 곧 그 전설은 사람들 마음에 위대한 존재의 상징으로 살아남아 세상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트맨이 정말 되려고 했던 것은 선이 아니라 선의 상징이 아닐까?
ο 사천왕과 배트맨의 이타심

▶ 운문사 작압전 석조사천왕상 – 우리나라의 사천왕상은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험상궂은 표정과 과장된 몸짓이 공포스럽거나 위협적이지 않다. 운문사 석조사천왕상은 작은 체구에 부드럽고 소박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천왕의 발 밑에 눌려 있는 악귀들조차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장난스럽고 친근하다. 우리 민족의 따뜻한 심성과 해학적인 기질이 돋보이는 훌륭한 예이다.
사천왕은 영웅이 아니다. 불교에서 영웅은 자신을 극복한 존재를 말한다. 다시 말해 불교의 위대한 영웅은 아라한(阿羅漢), 즉 붓다뿐이다. 사천왕은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영웅이 아니다.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불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영웅이 된다.
배트맨이 실제적인 힘보다 사람들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선을 수호하는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사천왕 역시 힘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서 악당을 두려워 떨게 만듦으로써 악을 징벌하고 악으로부터 선한 시민들을 지키려고 한다. 사천왕은 험상궂은 얼굴과 손에 든 지물, 그리고 아귀를 누르는 발로 악한들을 떨게 한다. 악한 자를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천왕의 추하고 험상궂은 얼굴 표정은 분명 신적인 존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의 신들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힘은 폭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설득과 감동, 지혜와 자비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보다 강력한 힘과 신통력을 가졌지만 아직 감정과 형상을 떠나지 못한 욕계의 존재인 사천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인 분노와 두려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악당들뿐,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제압하는 것은 사악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지만, 사천왕은 역발상으로 사악한 자들을 겁먹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한다.
고귀한 자들도 분노한다. 위력을 과시하여 악한 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다. 그들은 순수한 이타의 의지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을 보호하는 흑기사, 다크 나이트(dark knight)가 된다.
악으로부터 선을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심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점과, 완전한 이타적 희생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사천왕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았다.
사방을 위호하는 사천왕의 보호를 받으며 마지막 관문, 불이문을 통과하면 그곳에 고요하고 적정한 붓다의 세계가 있다. 모든 시비와 호오, 선악이 사라진 이 세계에는 한없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 불보살들이 머문다.
사천왕은 악당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착한 중생을 보호하지만, 불보살의 자비는 차별도 없고 한계도 없다. 그들은 천하의 악당도, 불법을 모르는 무지렁이도 구원한다.
연화대 :: 부처상과 보살상을 앉히는 자리. 본래는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앉았던 풀방석에서 유래하나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연꽃은 진흙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므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자리를 의미한다. 인도 신화에 따르면 비슈누의 배꼽 속에 있는 연꽃에 범천(梵天)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 또한 불성을 상징하여 봉오리 상태는 앞으로 불성이 필 것을 뜻하고, 활짝 피어 있으면 현재 불성이 활짝 피어 있음을 상징한다.
초기에는 연꽃 줄기만 표현하였으나 점차 꽃잎 끝이 위로 향한 앙련(仰蓮)과 아래로 향한 복련(覆蓮)을 합친 단판(單瓣), 여러 개가 포개진 복판(複瓣), 장식성이 강한 보련화(寶蓮花) 등으로 발전되었다. 형태는 크게 각진 형태와 원형이 있는데, 각진 것은 사각·육각·팔각 등이 주류를 이룬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화대 [蓮花臺] (두산백과)
2. 죽음, 축제가 되다
삶과 죽음의 이중주 <감로도>
ο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무도>

▶ 죽음의 무도 – 크로아티아 베람 지역의 성모 마리아 성당 묘지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이다. 나약한 여자들이나 죄 많은 자들은 겁에 질려 끌려가고 고관대작이나 성직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버티지만 죽음은 끝내 거부할 수 없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 할 때 노예 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들고 뒤따르게 했다. 이 월계관에는 특별한 문장이 씌어 있었다. 바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생애 최고의 순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 노예는 개선장군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이지만 내일 또 다른 날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북독일에서는 저승사자를 ‘친구 하인(Freund Hein)’이라고 부른다. 죽음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와 무장해제 시킨 뒤 무방비 상태에서 문득 저승으로 데려가는 자,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자이다. 그는 한 음 높게 조율된 바이올린으로 불길하고 귀에 거슬리는 〈죽음의 무도〉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회화에서는 해골이나 썩은 과일, 불 꺼진 초, 시든 꽃으로 생명이 사라진 것들의 추함을 강조하며 모래시계로 생명이 빠져나가는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환기시킨다. 이렇듯 서양에서 죽음은 삶과 대비되어 무력하고 추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양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죽음의 무도〉는 죽음을 해골로 의인화하여 표현하는데, 가만히 뒤에서 등장하거나 불쑥 나타나는 죽음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 음습하고 추한 것이다. 죽음은 지위의 고하,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중세의 숨 막히는 봉건 질서를 완화하기도 했다.
주로 수도원 회랑이나 공동묘지, 납골당 외벽에 그려진 이 그림들은 지옥과 저주받은 사람들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천국의 영생을 동경하고 신에게 헌신할 것을 호소했다. 이 그림들은 한편으로 돈이나 명예, 지위 같은 덧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라고 설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상의 삶을 단죄하는 심판자인 죽음을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욕망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닥쳐온다면 산 자의 세계에서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뒤집어보면 이 욕망 속에는 죽음을 금기시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고가 숨어 있는데, 신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종교 권력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양분으로 한다.
동양에서 죽음은 삶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가족들은 미리 묏자리를 봐 두고 윤달이면 수의를 준비한다.
우리에게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며 장례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의례였다.
반혼 :: 장례 후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반우(返虞)’, ‘흉제(凶祭)’ 등이라고도 하는데, 장례 후 만 2년이 되는 대상(大祥)까지의 모든 의례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유교 의례에서는 ‘3년 상을 치른다.’고 하며, 대상을 지낸 후 탈상을 하는 것까지를 상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상례는 점차 간소화되었으며, 특히 반혼과 관련된 유교식 의례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는 ‘49재’로 반혼 의례를 대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 원래 49재는 불교식 의례였으나 지금은 종교와 관련 없이 보편적인 탈상(脫喪) 의례로 정착하고 있으며, 광명 지역도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혼 [返魂]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ο 죽음, 또 다른 삶의 시작

▶ 선암사서부도전감로도 – 1736년 조선 3대 화가 중 하나인 의겸이 그린 불화로 당대 전형적인 감로도 형식을 갖추고 있다. 상단에 그려진 칠여래가 중단과 하단에 비해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
이승을 떠나고도 선뜻 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생과 사의 중간 어디에선가 떠도는 이름 없는 영혼을 위하여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아귀들에게 감로(甘露)를 베푸는 의식, 다시 말해 물과 뭍에서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을 천도(薦度)하는 수륙재(水陸齋)를 열어 그들을 다음 생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했다. 이때 장엄하게 제단을 차리고 대형 걸개그림을 내거는데, 이 그림을 〈감로도〉라고 한다.
〈감로도〉에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낱낱이 묘사되어 있다. 호랑이나 뱀에 물려 죽은 사람, 술병 들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바둑을 두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담장이 무너져 비명횡사한 사람 등 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초래할 법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말발굽이나 소달구지에 깔려 죽는 사람, 벌거벗기고 포박을 당해 죽거나 산적들에게 봇짐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봇짐장수, 주인에게 매 맞아 죽는 노비, 전쟁으로 죽은 사람 등 특정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죽음의 모습까지 〈감로도〉에는 당대를 살아간 민중들의 애환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다.
영혼을 천도하는 엄숙한 재식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조금 물러서면, 삶의 갖가지 모습이 드러난다. 근엄하게 경전을 읽는 양반네들이 흘금흘금 아낙네들을 곁눈질하고, 촌로들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남사당패들은 공을 던지고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는 등 온갖 재주를 부리고 옆에는 무희와 악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장고 가락에 맞추어 소리꾼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연회에 어서 가려고 어린아이를 들쳐 업은 아낙네, 젖먹이는 여인뿐 아니라 앞 못 보는 사람도 어린아이를 앞세워 길을 재촉한다. 죽은 자를 위한 그림, 〈감로도〉는 이처럼 흥청거리는 삶의 약동으로 꽉 채워져 있다.
ο 단비가 내리는 축제의 장 <감로도>

▶ 선암사무화기감로왕도 세부 – 목이 좁아 스님들이 주는 감로가 아니면 물을 마실 수 없는 아귀는 화염에 휩싸여 있다. 호랑이에 물려 죽거나 불에 타 죽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풍악에 맞춰 춤을 추고, 아낙은 아이를 챙긴다. <선암사무화기감로왕도>는 18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잘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당시 민초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쾌락의 정원 – 15세기에서 16세기 초 작품으로 왼쪽 패널의 에덴 동산에서 중앙의 쾌락의 정원, 오른쪽 패널의 지옥으로 이어진다.
프라도미술관에 있는 보쉬(Hieronymus Bosch)의 환상과 엽기가 가득한 〈쾌락의 정원〉에 그려진 천국과 지옥의 모습과 달리, 〈감로도〉에 묘사된 죽음은 끔찍하기는 하지만 괴기스럽지 않고 삶 역시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타락한 세상을 그린 〈쾌락의 정원〉은 죽음뿐 아니라 삶조차 혐오스럽고 기괴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감로도〉의 세계에서 죽음은 방종과 쾌락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죽음의 고통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에게 삶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묘사된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죽음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죽은 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혐오스러운 해골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지고의 존재, 불보살이다. 하늘 길을 안내하기 위해 인로왕보살이 깃발을 높이 들고 화려한 천의를 하늘거리며 하늘에서 내려오고, 정수리의 광명으로 하늘 길을 훤히 밝히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대동하고 아미타불이 직접 마중 나온다. 지옥이 다 비도록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저 신심 깊은 지장보살도 빠지지 않는다.
‘감로’를 영어로 번역하면 ‘Nectar’, 신들의 음료이다.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한다는 신비의 음료는 스님들의 수행 공덕이 아니면 마련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스님들은 제단을 마련하고 걸개그림을 내다 걸고는 그 아래서 경을 읽고 바라춤을 추며 외로운 영혼들에게 불보살의 자비가 내리기를 청하고 산 자들은 온갖 음식을 마련하며 정성을 다한다. 주변에 음식이 지천이어도 먹지 못하는 아귀들에게 이 날은 잔칫날, 비로소 주린 배를 채우고 타들어가는 갈증을 풀 수 있다.
수륙재 ::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
[네이버 지식백과] 수륙재 [水陸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ο 산 사람은 정화되고 죽은 자는 새롭게 태어나다
보들레르의 말처럼 죽음의 그림자에서 막 되돌아온 회복기 환자는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 생생한 관심”을 쏟는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한다. 삶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릴 기로에 서 있던 그는 모든 것을 열렬히 기억하고 싶어 한다.”
얼마나 많은 삶이 죽음에 기대어 있는가? “세상에 왔을 때 무일물이었듯이 갈 때도 무일물”
〈감로도〉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나아가 삶을 약동하게 하는 용광로이다. 그 생명과 죽음의 이중주에서 산 사람은 정화되고 죽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감로도>와 상상력의 변천
ο <감로도> 속의 두 세계

▶ 흥천사감로도 – 풍속화적 성격 덕분에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보기 드문 작품이지만 서양의 상상계에 의해 전통적인 상상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슬픈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 선암사무화기감로왕도 - <감로도>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나아가 삶을 약동하게 하는 용광로이다. 생명과 죽음의 이중주 속에서 산 사람은 정화되고 죽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 남장사감로도 세부 – 1701년 탁휘 등화승이 그린 감로도. 지옥문에서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영혼과 끊는 물속에서 괴로워하는 영혼,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인 등이 보인다. 무엇보다 총에 맞서 칼과 활을 들고 전쟁을 하는 모습이 있다. 남장사가 위치한 상주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백 년이 지났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진 전쟁의 기억을 생생히 보여준다.
오랫동안 동서양에서 상상력은 감정이나 직관 등과 함께 ‘오류와 허위의 주범’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상상력은 올바른 인식의 한 단계로, 미적인 인식의 하나로, 나아가 불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마음의 능력이다. 뒤랑(Gilbert Durand)이 말하듯 “이미지, 허구, 전설, 신화, 상징 등으로 이루어진 상상계는 주관과 세계가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 낸 세계이며 각 문화가 삶과 세계에 부여한 관념과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이런 이유로 초월적인 대상을 형상화해야 하는 종교예술에서 상상력은 더욱 중요하다.
상상계를 주제로 하는 일반 종교미술과 달리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재에 사용되는 〈감로도〉는 상상계와 현상계의 두 차원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 준다. 〈감로도〉를 보면 실제 수륙재가 벌어지는 현실의 장면과 함께 불보살들과 아귀와 지옥 등 상상계를 한 화면에 보여 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를 동시에 보여 주기 위해 〈감로도〉는 화면을 수직으로 삼등분하는데, 그 경계를 오색구름으로 표시하거나 장면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의 중심, 즉 중단은 수륙재가 벌어지는 절 마당을 묘사한다. 시식대 위에는 오색번을 길게 드리워 장식하고 향이나 초, 공양물을 올려놓아 현실 세계의 인간뿐 아니라 상상계의 존재들까지 초대한다. 그림은 마치 사진처럼 과거에 치러진 성대한 재의 기억을 불러온다. 의례가 진행됨에 따라 〈감로도〉에 재현된 불보살과 아귀, 지옥 등이 현실 세계로 스며들고 그림에서 일어났던 의례가 그대로 반복된다. 현실의 수륙재와 그림 속의 수륙재가 교차하며 반복되는 가운데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과거와 현재, 미래로 확장되고 천상과 지옥의 상상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처럼 〈감로도〉는 상상계와 현실 세계를 같이 펼쳐 놓음으로써 상상계를 현실 속으로 가져온다.
수륙재는 아난이 아귀에게 보시한 일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상상계와 현실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아귀가 있다. 시식대 앞에 단독, 또는 쌍으로 그려진 아귀들은 주름이 깊게 파인 못생긴 얼굴과 휘둥그런 눈, 치켜 올라간 눈썹, 흰 수염, 화염을 내뿜는 입, 깡마르고 볼품없는 몸으로 엉거주춤 발우를 들고 합장을 하고 있다. 아귀는 바늘처럼 가는 목구멍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항상 굶주림에 허덕인다. 재를 마련한 사람들은 의례를 베푼 공덕으로 아귀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대한 의식을 베풀 수 없을 때에도 그림 속의 오체투지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화하여 그림 속 의례의 공덕을 공유했다.
이들의 요청에 응하여 일렬로 나란히 천상에서 내려오는 일곱 여래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그림 상단을 꽉 채운다. 광박신여래(廣博身如來)는 여섯 범부의 미세한 몸을 버리고 청정한 허공의 몸을 깨닫게 하며, 이포외여래(離怖畏如來)는 붓다가 깨닫기 직전에 마라를 비롯한 훼방꾼들을 물리치고 성불한 것처럼 외로운 영혼들에게 두려움을 없애 주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해준다. 붓다의 자비로 아귀들이 재물과 보배를 얻고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목구멍이 넓어져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보승여래(寶勝如來)의 자비로 인색했던 업을 없애고 복덕을 갖추어 악도를 버리고 뜻대로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며 감로왕여래(甘露王如來)의 자비로 뿌려주는 한 방울의 감로수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즐거움을 얻는다. 다보여래(多寶如來), 묘색신여래(妙色身如來), 아미타여래 외에도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모습과, 죽은 사람의 혼을 연화대로 데려갈 가마를 대동하고 인로왕보살이 깃발을 높이 들고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극락세계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뒤엉킨 고통스러운 세계가 아니라 지장사 〈감로도〉에 묘사된 것처럼 신선들이 한가롭게 바둑이나 두면서 일 없이 유유자적 무위의 삶을 사는 곳이다.
아미타불과 보살들이 화려한 누각에 있고 그 앞 연못에는 거대한 연꽃이 피어 있다. 법장 비구의 서원에 따라 만들어진 이 세계는 잘 조경된 누각과 연못으로 이루어진 인공적인 공간이다. 이처럼 묘사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락한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 집이 화려하고 온갖 즐거움이 있는 궁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극락세계를 궁궐로 상상한 데에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투사되어 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일상적인 장면과 지옥과 아귀가 묘사된 상상계가 함께 존재하는 〈감로도〉 하단은 복잡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친다. 불교적 관점에서 아귀와 지옥은 실재하는 세계이지만 〈감로도〉에 묘사된 장면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상 속에는 뒤르켐(Émile Durkheim)이 지적하듯이 한 문화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지각하는 특별한 방식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
옛사람들이 지옥을 전생의 악행에 대한 벌로 받아들였던 것은 조선 시대 실제 형벌을 받는 사람처럼 지옥의 망령들이 목에 형틀을 건 채 깊은 성곽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옥에 투사했다.
상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끓는 가마솥은 화탕지옥을, 끝이 뾰족한 철침은 칼산지옥을, 형틀은 부자유를 상징한다. 타오르는 욕망과 분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곳은 화탕지옥이다.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가시 돋친 말을 내뱉을 때 그곳은 칼산지옥이 된다. 서로 미워하고 외면하면 냉기가 느껴진다.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랭한 인간관계가 곧 한빙지옥이다. 굳이 저승에 가지 않아도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은유와 상징에는 어떤 시대의 문화가 부여하는 삶과 세계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들이 느낀 내면적 진실이 반영되어 있다.
동서양미술에 공통적으로 죽음은 나체로 묘사되어 있다. “올 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 한 물건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말처럼 죽음이란 살아생전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근대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 재산 따위를 표시한다. 죽음 앞에서 살아생전 누렸던 신분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의미가 없다.
ο 해체된 상상계, 흥천사 <감로도>

▶ 흥천사감로도 세부 –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감로도>로 서양화의 기법을 차용할 뿐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들어온 신문물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되는 감로도이다. 기존 감로도에서 오색구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상상계와 현실세계가 연관성을 상실하고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의식을 바라보는 남자는 근대와 전통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조상의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상상계는 근대 문명을 만나며 빠르게 해체되어 버렸다.
흥천사 〈감로도〉는 서양의 상상계가 전통적인 상상계를 대체하는 과정을 기록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이 그림은 음영법과 원근법 등 서양화 기법뿐 아니라 조선 시대 〈감로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상이 등장한다. 〈감로도〉의 풍속화적 성격 덕분에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보기 드문 작품이며 동시에 서구적인 상상력에 의해 전통적인 상상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슬픈 역사의 기록이다.
화면 곳곳에 전통적인 상상계를 바라보는 근대인의 시선이 발견된다.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은 모던 보이와 짧은 스커트와 뾰족 구두로 멋을 낸 모던 걸은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상주와 스님들이 의례에 집중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의례에 참가하지 않고 곁에서 구경하고 있다. 그들에게 〈감로도〉의 세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며 그들의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타자로 인식된다.
연행자와 관객 사이의 단절은 농악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인 엔터테인먼트인 서커스처럼 관객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빈 발우를 내밀고 있는 아귀도 그로테스크하게 변해, 과거의 희화화된 아귀들과 달리 외면하게 된다.
흥천사 〈감로도〉에는 비록 전통적인 도상이 남아 있지만 과거의 그림에 나타난 활기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었던 전통적인 화면은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분할되어 있다. 기존 〈감로도〉에서 오색구름이나 장면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상상계와 현실의 세계가 연관성을 상실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흥천사 〈감로도〉는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의미, 곧 상상계가 서양 근대와의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 타자화되고 고유한 의미들을 상실해 가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ο 상상력, 공감의 능력
전통적인 〈감로도〉에 그려진 지옥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의 구원은 절실한 문제였다. 반면 그 세계의 실재성을 의심하는 근대인에게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는 것 역시 남의 일일 수밖에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의 육도(六道)가 있어 자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에 따라 그 세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윤회한다고 믿는다. 근대적인 합리성에 비추어 본다면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상상계에 그들의 행복과 고통을 투사하고 희망과 구원을 꿈꾸었다. 설사 그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적 현실성은 변함이 없다.
상상력이야말로 들뢰즈의 말처럼 “도덕적 선의 위대한 수단”이다.
“도덕의 요체는 자비심이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자기 것이 아닌 사상과 행위, 인격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타인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자신의 것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면” 도덕은 앙상한 의무 사항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감로도〉의 상상력은 바로 타자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동화시키는 힘이다.
반야용선과 악착보살
ο 밧줄에 매달려서라도 가리라, 악착보살

▶ 웅전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악착보살. 반야용선을 놓쳐 뱃사공이 던져 준 밧줄에 매달려 악착같이 극락세계를 향해 갔다고 한다. 수행자들에게 악착같이 수행하라는 경책의 뜻도 담고 있다.
가릉빙가 :: 아름답고 묘한 울음소리를 갖는 새이며, 히말라야 산과 극락정토에 산다고 하는 상상의 새. 극락조(極樂鳥)라고 한다. 정토 만다라 등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으로 그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릉빙가 [迦陵頻伽]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유타 :: 나유다(那由多)·나유타(那由佗) ·나술(那述)이라고도 한다. 1,000억을 말하는데, 때로는 10만 따위를 가리킬 때도 있다. 옛날 서적에는 자리를 나타내는 수사(數詞) ‘십·백·천·만·억·조’ 위에 ‘경(京)·해(垓)·자(秭)·양(穰)·구(溝)·간(澗)·정(正)·재(載)·극(極)’ 등의 수사가 기재되어 있고, 불전(佛典)에서는 이 위에 ‘항하사(恒何沙)·아승기(阿曾祗)·나유타·불가사의(不可思議)·무량대수(無量大數)’의 단위를 쓰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나유타 [nayuta, 那由他] (두산백과)
아미타불이 서원을 세워 만들어 놓은 서방 극락정토까지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여행. 얼마나 즐거우면 나라의 이름을 즐거움이 있는 곳, ‘극락’이라고 했을까? 대성인로왕보살이 앞장서 길을 안내해 주고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을 대동하고 맞이하러 온다. 얼마나 중생을 어여삐 여겼으면 직접 마중 나오기까지 할까?
ο 청정한 즐거움의 나라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움에 떠는 순간을 위하여 불교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해 두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미타불의 영토, 극락세계이다. 아미타불이 전생에 법장 비구였을 때 마흔여덟 가지의 서원을 세워 만든 것으로, 안양국, 즉 편안한 나라라고도 하고 정토, 즉 청정한 땅이라고도 부른다. 아미타불의 세계는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이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이 전생에 수행할 때 삼계(三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습이 더럽고 탁한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 아파 특별히 맑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것은 마음을 흩트리는 미혹의 원인으로 여긴다. 따라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아름다운 소리는 귀를 먹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눈을 멀게 한다고 하여 경계한다. 그러나 극락정토에서는 감각적인 즐거움조차 법의 즐거움으로 바뀐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극락정토는 감각적 즐거움이 있더라도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계(慾界)가 아니며, 여러 가지 궁전과 누각, 나무와 땅, 연못이 건설되어 있는 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인 색계(色界)가 아니다. 또한 소리와 형상, 향기, 감촉이 존재하는 감각의 세계이므로 무색계(無色界)가 아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끝없이 윤회를 계속하는 변화하는 세계, 거짓된 세계가 아니라 맑고 청정하며 진실한 세계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다시는 삼계의 고통의 바다, 윤회의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삼계의 제약을 벗어나 있다.
이처럼 삼계의 제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청정한 이 국토는 끝없이 넓다.
유마 거사 :: 과거세(過去世)의 부처 곧 금속여래(金粟如來)로 비야리성(毗耶離城)에서 늘 칭병(稱病)하고 누워서 문병 오는 불제자들에게 병을 가지고 설법했음. 유마힐거사(維摩詰居士). 정명(淨名).
若日毗耶淨名示疾 今日曹溪牧牛作病 未審是同是別(약일비야정명시질 금일조계목우작병 미심시동시별 ; 옛날 비야에서 정명이 병을 보였는데, 오늘 조계에서 목우가 병이 났으니, 그것이 같은 것이오 다른 것이오?)<김군수金君綏 조계산수선사불일보소국사비명曹溪山修禪社佛日普炤國師碑銘>
作書乞飯維摩詰 不厭空門淸淨債(작서걸반유마힐 불염공문청정채 ; 편지 써서 유마힐에게 밥을 비나니, 공문의 깨끗한 빚을 싫어하지 않도다.)<임춘林椿 기홍천원寄洪天院>
鬢絲禪榻塵機息 每見維摩聽夜談(빈사선탑진기식 매견유마청야담 ; 구레나룻 스님이 참선하는 자리는 속세의 기틀 없고, 밤이면 늘 유마거사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네.)<성현成俔 김자고고양장-동사심승金子固高陽庄-東寺尋僧>
[네이버 지식백과] 유마거사 [維摩居士] (한시어사전, 2007. 7. 9., 국학자료원)
근기 :: 산스크리트로는 인드리야(indriya)이며, 근기(根器) 또는 줄여서 기(機)라고도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 즉 본성을 나무의 뿌리[根]에 비유하고 그것의 작용을 기(機)라고 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특히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화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대상을 가리킨다. 수행을 하고 안하는 것, 법(法)을 배우고 익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이 근기의 정도에 달려 있다. 근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다르므로 근기가 높은 사람은 교법을 받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에 따라 근기를 가름하는 말도 여러 가지이다. 예를 들면 소질과 능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상근·중근·하근으로 나누고, 성품에 따라 악근과 선근으로 나누며, 자질에 따라 돈근(頓根)과 점근(漸根)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과거세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갖게 되는 기를 명기(冥機)라 하고, 현세의 삼업(三業)으로 힘써 선을 실천하는 기를 현기(顯機)라 하며, 교화의 대상이 되는 기를 권기(權機), 실제로 교화를 받아야 할 상대의 기를 실기(實機)라 한다.
부처는 중생의 근기를 살펴 그에 알맞게 설법을 하는데 이를 수기(隨機) 설법이라 한다. 이 가르침에 근기가 적합한 것을 두기(逗機)라 하고, 부처가 설법의 방편으로 취하는 근기와 가르침을 받는 보살이나 중생의 근기가 일치하는 것을 감응(感應)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기 [根機] (두산백과)
범음 :: 범음이란 불사(佛事)의 법회(法會) 때 쓰이는 네 개의 법요(法要) 중 산화(散花) 뒤에 부르는 대범천왕(大梵天王)이 발하는 음성(音聲)이라는 뜻이다. '쟁음(爭音)을 여러 보살에게 공양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범(梵)이란 범천(梵天)과 관련되어 청정(淸淨)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범음 [梵音]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법미 ::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법(敎法)을 말함. 그 뜻이 깊고 미묘하여, 이 뜻을 체득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되므로 세상 음식물의 좋은 맛에 비유한 것임. 법맛.
[네이버 지식백과] 법미 [法味]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선열 :: ① 선정(禪定)에 드는 기쁨. ② 참선할 때 가슴에 잔잔히 사무치는 기쁨.
[네이버 지식백과] 선열 [禪悅]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시공사)
이승 :: 승(乘)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의 가르침을 뜻함.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의 두 가지 가르침.
① (1) 소승(小乘). 자신의 깨달음만을 구하는 수행자를 위한 부처의 가르침. 자신의 해탈만을 목표로 하는 성문(聲聞)·연각(緣覺)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
(2) 대승(大乘). 자신도 깨달음을 구하고 남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수행자를 위한 부처의 가르침.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을 위한 부처의 가르침.
② (1) 성문승(聲聞乘). 성문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부처의 가르침. 성문의 목표인 아라한(阿羅漢)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부처의 가르침.
(2) 연각승(緣覺乘). 연기(緣起)의 이치를 주시하여 깨달은 연각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 연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부처의 가르침.
③ (1) 일승(一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부처의 가르침.
(2) 삼승(三乘). 성문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성문승(聲聞乘), 연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연각승(緣覺乘), 자신도 깨달음을 구하고 남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행하는 보살을 위한 보살승(菩薩乘).
열일곱 가지의 청정한 공덕으로 성취된 극락정토는 불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상향, 유토피아이다. 그곳은 고통을 지니고 아직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중생까지 받아 주는 자비의 땅이다.
불교에서 미적인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을 거두어 주고 두려움을 덜어 주는 자비의 방편이다. 지극한 즐거움의 세계는 붓다와 보살들만이 즐기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헐벗고 고통 받는 중생들마저 껴안은 우리들의 세상이다.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ο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

▶ 통도사 용선접인도 – 갓을 쓴 선비, 아낙네, 수행자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합장한 채 앉아 있다. 누구든지 배를 타기만 하면 모두 극락으로 데려가 준다는 반야용선 이야기는 일반 백성들에게 더 큰 호소력이 있었다. 뱃머리의 용과 배 아래의 파도와 연꽃이 인상적이다.

▶ 미황사 대웅전과 부도탑 – 법당이 곧 반야용선인 경우도 있다. 땅끝마을 해남에 위치한 미황사 대웅전 주춧돌에는 게와 거북이 새겨져 있고, 대웅전 현판 양 옆에는 용이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법당인 셈이다. 부도탑에도 게, 거북이,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새겨져 있다.
아미타불이 망자를 맞이하러 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내영도(來迎圖)라고 한다.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18호 고려 시대 〈아미타삼존도〉[아미타여래삼존내영도]는 경전의 설명에 잘 맞게 묘사되어 있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대동하고 수행자를 맞이하러 오는 아미타불의 이마에 있는 백호로부터 밝은 빛이 흘러나와 마치 조명을 비춘 듯 망자를 비추고 있고 관세음보살이 허리를 굽혀 준비해 간 연꽃 대좌를 그에게 내밀고 있다. 미소년같이 앳된 모습의 지장보살은 보주를 들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일반적인 고려 불화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얼굴이 정면상을 하지 않고 화면 한 구석에 있는 예배자를 향해 측면상을 하고 있다. 이 구도 덕분에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자연스럽게 그림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된다.
반야용선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극락정토로 갈 수 있는, 한 명만 아니라 여러 명을 함께 데려가는 좀 더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불교가 쇠퇴했던 조선 시대에는 염불수행이 대중화되었으므로 아미타불의 구제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반야용선도〉가 많이 그려졌다. 누구든지 배를 타기만 하면 모두 극락으로 데려가 준다는 반야용선 이야기는 종교적 수행을 하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에게 더 큰 호소력이 있었다.
아예 법당이 곧 세상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배이기 때문에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생각을 적용시킨 경우도 있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은 기단부터 천장까지 반야용선의 모티브가 반영되어 있다.
3. 불교예술 속의 인간학

▶ 운문사 오백전 – 붓다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곁을 지켜 주는 존재인 나한은 붓다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다른 불상들과 달리 인간적인 특징이 투사되었다. 붓다의 오백제자 각각이 평범한 외모에 얼굴 표정이나 자세도 저마다 다르다.
나한상과 <라이프 오브 파이>
ο 닮음, 진짜 같은 가짜

▶ 거조암 영산전 오백나한 – 나한은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예의범절이나 고상한 취미, 뛰어난 학식과 진지한 교양마저 하찮게 여기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걸림 없는 삶을 산 자들이다. 옛사람들은 나한의 비범한 신통력도 숭배했지만 탈속적인 모습에 더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예술 작품의 비평 기준은 “대상을 얼마나 닮게 그리느냐”였다. 예술 작품과 그 원본이 된 실제 사물 사이의 관계를 서양에서는 ‘미메시스’라고 부르며 동양에서는 ‘사(似, 닮음)’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개념들의 차이는 크다. 무엇보다 동양에서는 대상의 외관을 유사하게 그린 것을 ‘형사形(似)’라고 하고 대상의 정신성이나 기운을 생동적으로 그려낸 것을 ‘신사(神似)’라고 구별한다. 그리고 전자보다 후자를 높이 평가하는데, 서양 미학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붓다의 제자로서 나한(羅漢, 아라한의 준말)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신앙의 대상이 된 나한은 실존하지 않는 공상적인 존재이다.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까닭에 영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단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거나 ‘십육나한’, ‘십팔나한’, 오백나한’, ‘1천2백나한’ 등 집단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숫자에 따라 나한을 모시는 전각을 독성각(獨聖閣), 십육전, 오백전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나한신앙은 당나라 때 성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크게 흥성했다. 고려 때에는 비를 내리거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 달라고 왕이 친히 나서서 나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국왕이 되기 전에 나한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런 나한들을 형상화한 〈나한도〉에 대한 옛사람들의 글에 ‘핍진하다’, ‘살아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자주 보인다.
실존하지 않는 종교적 도상에 대하여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생기가 있다’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다. 엄격히 말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나한상에 대하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까?
ο 자유와 개성, 익살과 친금함까지 세상을 초월한 자, 나한
미술사 연구에서 나한상은 도교와 불교의 종교적 인물을 그린 도석인물화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나한상은 남북조 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상당히 많은 수의 나한도가 그려졌다. 위진남북조 시대, 유송(劉宋)의 법현(法顯)스님과 법경(法經)스님이 처음으로 나한상을 조성했다.
도석인물화는 주로 종교적 용도로 제작되었지만, 오대(五代)이후에는 불상이나 보살상보다 나한상과 관음상이 더 많이 제작되었으며 종교적 용도보다 감상용으로 많이 그려졌다. 특히 나한상은 직업화가나 승려화가뿐 아니라 문인화가들도 즐겨 그렸다.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 경전에서 규정하는 대로 32상 80종호의 도상을 그리고 고타마 싯다르타의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외관은 왕족 또는 귀족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붓다의 제자인 나한의 경우, 특별한 도상학적 근거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붓다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곁을 지켜 주는 존재인 나한은 붓다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받아들였던 만큼 다른 불교 도상들과 달리 인간적인 특징을 투사할 수 있었다.
독성각에 모셔져 있는 나반존자(빈두로존자)의 경우, 『아육왕경』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을 덮을 만큼 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것이 전범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혼탁한 말법(末法)세상을 지키며 불로장생하기 때문에 백발의 나한은 중국에 들어온 다음 도교의 신선과 닮은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개성과 다양성은 여타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명대 진계유(陳繼儒)가 지은 『이고록』에는 오대의 승려화가인 관휴가 그린 〈십육나한도〉 중 〈나고나존자〉1폭이 관휴의 자화상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를 가진 서역에서 건너온 실제 스님의 모습을 재현한 나한상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무리 나한의 비범하고 초월적인 특징을 재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도 사실성과 거리가 멀다. 세간사를 초탈한 나한의 신통 자재를 표현한다고 생각되지만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다.
ο 환상과 사실의 경계

▶ 완주 송광사 나한전 – 1656년에 지은 것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172호. 노년의 나한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을 덮을 만큼 긴 눈썹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의 나한은 눈썹이 가늘고 수염도 짧으며 머리도 짙게 채색하였다.
얀 마텔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한 청년과 호랑이의 표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난당한 인도 청년 파이는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아, 작은 구명보트에서 아버지의 동물원에서 기르던 오랑우탄, 얼룩말, 하이에나, 그리고 벵골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함께 표류하게 된다. 곧 하이에나가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고 다시 파이를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만다.
파이는 구조된 뒤 일본인 선박회사 직원들에게 그가 작은 구명보트에서 호랑이와 함께 지냈으며 아름다운 식인섬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파이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물들 대신 프랑스 요리사와 다리를 다친 일본인 선원, 그리고 파이와 그의 엄마 이야기로 들려준다. 요리사가 선원을 죽이고 그 다음 엄마를 죽인다. 그것을 보고 분노한 파이가 요리사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남았다는 새로운 이야기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와 달리 믿을 만하지만 잔인하고 슬프다. 이전 이야기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었던 식인섬도 파이가 식인에 대한 죄의식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어 버린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파이가 가족을 잃고 망망대해를 떠돌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뿐이다. 파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들려주었다. 하나는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믿기 힘들고, 다른 하나는 그럴듯하지만 삭막하고 잔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믿기 어렵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믿을 만하지만 잔혹한 이야기. 영화는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말하지 않고 관객에게 선택을 맡긴다.
영화는 우리에게 파이의 이야기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실’이 거기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일까?
예술 작품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시가 역사보다 더 진실하다”고 말했던 까닭은 시가 실제 사건보다 더 ‘그럴듯하기(verisimilitude)’ 때문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럴듯함’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실제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과학도 종교도 ‘사실성’의 근거는 믿음이다.
ο 일(逸)의 미학

▶ 미황사 도솔암 후불탱화 – 다리를 꼰 채 눈을 치켜뜬 나한상은 다른 나한도에도 등장하는 도상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본존불 바로 아래 배치하는 독특한 구성 때문에 마치 본존불을 째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불경스럽고 도발적인 나한을 보고 있으면 불교의 정신, 조사의 가풍이 얼마나 격이 없고 걸림이 없는지 감탄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옛사람들은 역사적인 나한의 이야기보다 전설적인 나한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바위에 걸터앉거나 나무 아래 쉬고 있는 현실적인 나한을 그리기도 했지만 호랑이를 타거나 용을 안고 있는 공상적인 모습으로도 그렸다. 그러면서도 그 모두가 ‘매우 생동적’이라고 믿었다.
세상 바깥에 사는 사람들, 즉 격외(格外)의 인물인 나한은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예의범절이나 고상한 취미, 뛰어난 학식과 진지한 교양마저 하찮게 여기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고 걸림 없는 삶을 산 자들이다. 옛사람들은 나한의 비범한 신통력도 숭배했지만 나한의 이런 탈속적인 모습에 더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
옛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위와 무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세상의 격식을 하찮게 여기고 종교적인 엄숙성마저 던져 버린 모습을 ‘일격(逸格)’이라고 하여, 동아시아 정신세계가 도달한 최고의 단계로 칭송해 왔다. 예술 작품에서 ‘일(逸)’은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한 ‘능(能)’이나 대상의 정신성까지 묘사한 ‘신(神)’, 나아가 기운 생동하는 아취를 절묘하게 묘사한 ‘묘(妙)’의 단계를 뛰어넘는 예술의 최고의 경지이며 문인화가 지향한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고 보면 유교적인 격식과 질서에서 항상 조신하게 행동해야 했던 사대부들이 나한상에 열광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나반존자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ο 정의와 도덕이 사라진 세상

▶ 희랑대 나반존자 – 붓다의 나라에서 노인은 육체적으로 쇠약하거나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만큼 지혜롭고 무욕한 존재이다. 희랑대 나반존자의 동자처럼 해맑고 소박한 모습은 ‘핍진하다’는 표현 그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내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붓다가 없는 세상, 붓다의 가르침도 사라져 버린 세상을 말법시대라고 한다. 코엔 형제가 만든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약 밀매 현장에서 주운 2백만 달러 때문에 한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된 사냥꾼 모스와 파리를 죽이듯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 쉬거의 잔혹한 추격전이 전면에 배치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돈을 얻기 위해 사냥꾼 모스는 자신이 무엇을 걸었는지조차 모른 채 목숨을 건 내기를 하고 있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멈출 수 없다. 연쇄살인범 쉬거는 죽음에 이르러야 끝나는 탐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인생은 매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을 했어. 다 거기서 초래된 일이지. 결산은 꼼꼼하고 조금의 빈틈도 없어. 그림은 그려졌고 당신은 거기에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절대로, 인생의 길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더구나 없지.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처음부터 정해졌어.”
거액을 습득하는 행운과 동시에 살인마에게 쫓기는 불행이 시작된다. 모스가 습득한 거액 중 죽기 전에 사용한 돈은 고작 몇십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에 맡겨져 있다. 돈을 얻는 것이 우연의 결과이듯 죽음도 우연히 결정된다. 우연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며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다. 쉬거는 우연이 판을 치고 끊임없이 게임의 룰이 바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자비함과 무도함을 상징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죄 없는 모스의 아내를 살해하고 떠나는 순간,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자동차 사고로 그는 치명상을 입는다. 혼돈, 바로 그것이 우연이 지배하는 현실의 진짜 모습이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조차 원칙을 따르거나 순서에 맞추어 오는 것이 아니다. 늘 변화하는 현실을 따를 수 없는 노인은 시대에 뒤진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늙은 보안관 벨은 삼촌에게 푸념조로 이야기한다.
“언제나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신이 어떻게든 내 삶으로 찾아올 거라고. 그런데 오지 않네요.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아마 내가 신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삼촌이 대꾸한다.
“네가 겪은 것도 새로운 건 아니야. 이 나라에선 사람들이 늘 힘들어.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너를 기다려 주지도 않을 거고. 그게 바로 허무야.”
폭력만 난무하는 이 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지혜와 편안함이 쓸모없는 나라, 그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ο 나반존자는 왜 노인인가?

▶ 나반존자 – 운문사 사리암의 나반존자(우)가 점잖고 부드럽고 온화하다면, 대승사 독성탱의 나반존자(좌)는 희고 긴 눈썹, 웃음 가득한 주름진 얼굴과 편안한 자세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반존자는 소나무 아래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꽃밭 위에 앉아 있어 이채롭다.
나반존자 ::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깨달아 성인이 된 사람. 사찰에서는 독성각(獨聖閣)에 모셔지며 산신·칠성과 함께 삼성각에 모셔지기도 한다. 남인도 천태산(天台山)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 잎이 피고 지는 것, 봄에 꽃이 피는 것,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 등 변함없이 운행되는 우주의 법칙을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 삼명(三明)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능력을 지녔다. 삼명은 전생을 꿰뚫어 보는 숙명명(宿明明), 미래를 보는 천안명(天眼明), 현세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누진명(漏盡明)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으로 자리이타, 곧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므로 중생의 공양을 받게 되었다.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부처의 제자가 된 나한으로 말법시대에 출현하여 중생들을 교화한다고 하나 부처의 제자 중에는 그의 이름이 없고, 이름을 거론한 경전도 없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은 단군신앙에서 생겨난 우리나라 고유의 신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에 독성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693년(숙종 19)이며, 18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찰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또 다른 설로 십육나한 중 한명인 빈두로존자로 보기도 한다. 흰 머리와 흰 눈썹 등 외모상 비슷한 점이 많고 신통력이 있다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말법시대에 나타나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없애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였다.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말에 나반존자 신앙이 더욱 성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험이 큰 성인이나 성격이 매우 엄하고 무서워 공양을 드릴 때는 목욕재계는 물론이고 공양물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찰 전각에는 대개 그림으로 모셔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나반존자 [那般尊者] (두산백과)
중국의 고전 『노자』는 성은 이李씨고 이름은 이耳이며 자는 담(聃)이라고 전해지는 주나라의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공자보다 스무 살 정도 연장자이며 공자가 예를 물었다고 전해지는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그의 이름이 왜 ‘노자’인가에 대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칠십 년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노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노자의 ‘나이 듦’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전통에서 나이 듦은 지혜의 원천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노자』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로 세상에 없는 지혜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붓다를 ‘황면노자(黃面老子)’라고 불렀다. 불상의 황금빛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만, 불교가 도교와 동일시하여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노인을 지혜로운 존재로 보는 중국적 사유가 투영된 결과이다.
정작 대부분의 불상은 노인의 모습이 아니다. 적멸의 몸을 상징하는 붓다의 몸은 시간성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상에는 나이와 같은 시간적인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시간성이 강조된 도상이 바로 나한상이다. 나한의 얼굴에는 청년, 장년, 노년의 특징이 뚜렷이 표현된다. 아마도 아직 붓다가 되지 못한 아라한에게는 초월적인 속성보다 인간적인 속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오백 명의 아라한 중 대표인 나반존자는 백발에 흰 수염을 드리우고 흰 눈썹이 길게 드리운 노인으로 묘사된다.
사회변동이 거의 없었던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지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듦은 지혜의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나한의 천진한 얼굴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육체적인 힘과 물질적 소유보다 자연으로 회귀하는 소박함과 무욕을 더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 준다.
미래의 붓다가 오기 전까지 붓다가 없는 세상, 무도하고 냉혹하며 진리가 사라진 침묵의 말세를 지키는 존재는 모든 욕망이 무상함을 깨달은 욕심 없고 지혜로운 늙은 아라한일 수밖에 없다. 붓다의 나라에서 노인은 육체적으로 쇠약하거나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만큼 지혜롭고 무욕한 존재이다.
동자승, 천진함의 상징인가?
ο 만들어진 이미지, 동자승

▶ 운문사 명부전 동자 –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동자승의 이미지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말하자면 불교적인 감수성을 전하는 아이콘으로 일종의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동자승의 이미지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출연하는 아이들도 실제 동자승이 아니라 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단기출가 동자승이다.
동자승의 이미지가 대중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채봉의 창작동화 『오세암』과 월북 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84년 발표된 정채봉의 『오세암』은 설악산 오세암에 얽힌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동화로, 한국 근대희곡사상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는 『동승』은 1939년 3월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연극 경연대회에 〈도념〉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되어 초연되었다가 해방 이후 간행된 희곡집 『동승』에 수록되었다. 작가가 월북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된 1988년에 비로소 세상에 소개되었다.
이 두 영화가 기대고 있는 감성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산사에서 외롭게 자라는 동자승에게 ‘어머니’는 외로움의 원인이자 그리움의 대상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 준 존재이자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즉 칼 융이 말한 아니마(anima)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갈구하는 동승의 그리움은 세속적인 정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고독과 소외를 의미한다. 『오세암』과 『동승』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보여 주지만 결국은 자신의 근원으로 회귀함으로써 그리움을 종교적인 구도로 승화시킨다.
『오세암』이나 『동승』의 동자승 이미지에는 선재동자나 불교경전이나 설화에서 익히 보아 온 이미지와 다른 점이 있다.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이미지는 과거의 전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순진무구함을 동자승의 본질로 제시한다. 두 영화는 모두 동자승을 숭고한 구도자보다 천진난만한 동심의 상징, 더 나아가 종교적인 순수성으로 재현하고 있다.
ο 아동은 없었다
계관시인 :: 본래 영국왕실이 영국의 가장 명예로운 시인에게 내리는 칭호. 계관시인이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명예의 상징으로 월계관을 씌워준 데서 유래한다. 영국의 경우 종신제이며 지금은 총리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궁내관(宮內官)으로서 연봉을 받으며, 왕실의 경조사 때 시를 지어 바치는 등 특정한 의무가 주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폴로에게 바친 계관은 옛날부터 시인이나 영웅에게 그 영예를 기리어 수여되어왔다. 이 칭호는 제임스 1세가 1616년에 B.존슨에게 수여한 것이 최초이지만, 정식으로는 1670년에 J.드라이든이 임명되어 연봉 300파운드와 카나리아제도산(産) 포도주 1통을 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1790년 H.J.파이가 포도주 대신 현금을 원하면서부터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관시인 [poet laureate, 桂冠詩人] (두산백과)
어린아이가 심오한 ‘시적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낭만주의적 아동관은 루소의 『에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성서』에서 어린아이를 미성숙의 상태로 이해한 것은 물론이고, 데카르트의 생득관념을 반박하기 위해 인간 정신을 ‘백지상태(tabula rosa)’로 가정한 근대 경험주의 철학자 로크도 어린이의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어린아이를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에서의 인간 상태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본 루소의 아동관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에밀』에서 그는 인간이 백지상태로 태어난다고 본 로크식의 논의는 물론이고 원죄를 짊어진 인간이라는 『성서』의 도그마에 반박하면서 “인간 정신에 있어서 근원적인 타락은 있을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한다. 그는 어린아이를 순수한 인간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루소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주목한 것은 그 순수성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잠재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17세기 이전 서양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작은 어른’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취급하지 않았으며 하층민의 경우?20세기에 들어서도 이런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아동의 탄생』의 저자 아리에스(Phillippe Ariès)에 따르면, 중세인에게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거나 특별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이자 티 없는 순수함을 지닌 존재라는 관념은 낯선 것이었다. 그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동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ο 동자승, 천진불의 상징이 되다

▶ 운문사 명부전 동자 – 불교에서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산혜연 선사는 “아이로서 출가하여 세상일에 물들지 않고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리라”고 발원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에서 동진(童眞)출가는 예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붓다의 아들 라훌라(Rahula)가 출가한 이후로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승단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들을 범어로 구마라(kumāra)또는 구마라카(kumāraka)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동진(童眞)’이라고 하며 남자아이는 동남, 여자아이는 동녀라고 불렀다.
많은 스님들이 다음 생에 동자승이 되기를 발원했던 것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보살을 동자의 형태로 조성한 것은 보살이 여래의 왕자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세상의 아이들처럼 그들에게 음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세암』과 『동승』 그리고 수많은 동자승 캐릭터가 재현하는 동자승 이미지는 불교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아동의 천진난만함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의 독특한 아동관이 투영된 것이다.
명부전 이야기
ο 야마와 염라왕

▶ 운문사 명부전 – 저승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로 가는 곳이었다. 옥황상제는 염라왕이 죄인들을 계속 용서하자 그를 서열 1위에서 5위로 강등시켰다. 너그러운 것도 허물이 된다.

▶ 운문사 명부전 시왕들 – 시왕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해 주고 가벼운 죄를 지은 자에게 뉘우침의 기회를 주고 악한 자를 엄히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역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여러 명이 다스리는 것이 더 공정했던가 보다.
명부전의 원래 주인공은 도교의 신인 시왕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도 그 중 하나이다. 염라왕은 도교의 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 인도의 신, 야마(Yama)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토착화된 신이다. ‘쌍둥이’라는 뜻의 야마는 여동생 야미와 함께 사후세계를 지배하는데, 각각 남녀 귀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쌍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야마의 이야기는 고대 인도 브라만교의 성전인 『리그베다』에 처음 등장한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된 야마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개척한 다음 그 세계의 왕이 되었다. 그가 만든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저승이 아니라 극락세계였다.
저승의 성격이 바뀐 것은 또 다른 브라만교 성전인 『아타르바베다』의 지하세계, 즉 나라카(Naraka)의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우리말 ‘나락’의 어원인 나라카는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어둠의 세계인 지옥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후세계의 성격이 바뀌자 그 세계의 지배자인 야마의 성격도 바뀌어 선악을 판정하는 심판자가 되었다. 그는 네 개의 눈과 반점을 가진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개들은 국경을 지키며 야마의 전령으로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불교에 편입된 이후 저승은 신의 심판에 따라 가는 곳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가는 장소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야마의 역할도 전생의 업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정도로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전생의 업이 소멸할 때까지만 머물다가 업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신의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기독교의 ‘지옥’과는 완전히 다르다.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태산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는데, 특히 태산에는 사람의 수명을 적은 명부가 있고 태산부군이 저승의 귀신들을 통솔한다고 생각했다. 불교가 도입된 후, 야마는 중국 고유의 태산부군 신앙과 결합하여 ‘염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한다.
도교에서 염라왕은 처음에는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왕이지만 지옥에 있는 탓에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송 시기에 염라신앙은 민간에서 크게 성행하여 ‘십전염왕’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 도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에 의해 염라왕은 지옥과 오악의 신병과 귀졸을 통치하는 직책에 책봉되었다. 이제 염라왕은 형벌을 받는 처지에서 지옥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었는데, 염라왕이 다시 그곳을 열 개의 궁전으로 나누어 각각에 주인과 이름을 정함으로써 ‘십전염왕’이라는 집단통치체제가 완성된다. 염라는 점차 신적인 속성이 약화되어 관료의 성격을 띤다.
송나라에 들어와 서열 1위였던 염라왕이 너무 너그러워서 죄인들을 계속 용서하자 옥황상제가 그를 서열 5위로 강등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런데 염라왕의 위상이 지옥의 유일한 통치자에서 집단 심판관의 일원으로 바뀐 데에는 당송대 현실 사회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안사의 난 이후 귀족층이 몰락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등용된 사대부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관료 체제가 정착하였는데, 사후 세계도 현실 사회를 모방하여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뀐 것이다.
십전염왕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해 주고 가벼운 죄를 지은 자에게 뉘우침의 기회를 주고 악한 자를 엄히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시왕신앙은 불교의 사십구재 의식과 결합하여 망자는 사후 칠일마다 시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 따르면, 첫 번째 칠일에는 진광왕의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칠일에는 초강왕, 세 번째 칠일에는 송제왕, 네 번째 칠일에는 오관왕, 다섯 번째 칠일에는 염라왕, 여섯 번째 칠일에는 변성왕, 일곱 번째 칠일에는 대산왕의 심판을 받는다. 이때까지도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되지 않으면 백 일째 되는 날 평등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고, 만 일 년이 되는 일주기의 소상(小祥)에는 도시왕, 만 이 년이 되는 삼주기의 대상(大祥)에는 오도전륜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는 염라대왕 앞에서 망자가 거울에 비친 전생의 업을 보고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염라왕은 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평등왕이라고 의역되기도 한다.
염라대왕에게 중국식의 ‘포(包)’라는 성도 주어졌다. ‘포’는 ‘포청천’으로 잘 알려진 북송 시대 유명한 관리, 포증(包拯)의 성에서 따온 것으로, 청렴하고 정의롭고 사심 없는 판관이었던 포증이 사후에 염라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신화적인 존재조차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의 속성을 덧씌우는 중국 신화의 독특한 특징도 잘 보여 준다.
염라왕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인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도 좀처럼 죄악이 줄어들지 않자, 염라왕은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을 만들었다. 금강산 관광은 중국 사람들까지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첫 번째 소원이었다. 염라왕은 금강산 일만이천 봉우리마다 보살을 머물게 하고 팔만 구 암자를 짓도록 하였으며, 길목마다 명경대, 황천강, 반야봉, 비로봉 등을 만들어 마음을 비추어 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ο 지장보살과 명부신앙
조선 초까지 명부전에는 시왕이, 지장전에는 지장보살이 주존(主尊)이 되어 각각 다른 종교적 역할을 담당했다. 무독귀왕 같은 지옥왕은 있었지만 열 명이나 되는 지옥왕은 없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찰에서 지장보살이 명부전의 주존이 된다.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루고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의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대자비의 보살이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조선 사회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못해, 지장보살이 직접 지옥문을 열어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시왕이 다스리는 명부전으로 입성한 것이 아닐까?
이제 명부전의 중앙에는 지장보살이 놓이고 좌우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그를 보좌한다. 그 좌우에 주존의 위치에서 물러난 저승 세계의 시왕들이 차례로 배치된다.
도명존자는 본래 중국 양주에 있는 개원사의 스님이었으나 778년 사무상의 실수로 원래 저승으로 불러오려고 했던 용흥사의 도명 스님 대신 저승사자에게 끌려 명부로 가게 되었다. 다행히 그 사실이 밝혀져 이승으로 돌아온 후 그는 누구보다 지옥의 사정을 잘 안다는 점 때문에 지장보살의 협시보살로 발탁된다. 무독귀왕은 지옥의 왕으로 지장보살이 처녀였을 때 안내했던 인연으로 협시보살이 되었다.
명부전 입구에는 험상궂은 인왕이 지키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 판관과 녹사가 도열해 있다. 판관은 시왕들을 대신하여 죄인을 심판하고 녹사도 부지런히 심판 기록을 문서에 써 내려간다. 이어서 일직(日直)사자, 월직(月直)사자, 시직(時直)사자, 연직(年直)사자 등 명부전의 네 명의 사자와 우두나찰(牛頭羅刹)과 마두나찰(馬頭羅刹)도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 도열해 있다. 그 밖에 망자의 집을 찾아가 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는지를 점검하는 감재(監齋)사자와 망자의 죄를 기록한 문서를 내보이고 죄인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은 직부(直符)사자가 있다.
명부전의 동자들

▶ 김룡사 동자 – 죄와 벌을 판정받는 절박한 순간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어린아이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긴장되고 음습한 명부 세계에 있는 걸까?
ο 그 많은 동자상은 왜 명부전에 있을까?
사찰의 전각 가운데 동자상을 가장 많이 둔 곳은 명부전이다. 간혹 동자상이 없는 명부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 명부전에는 동자상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구의 동자상이 배치되어 있다.
만해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시왕은 불교 고유의 신앙이 아니며 저급한 불교문화의 형태”라며 시왕 무용론을 주장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명부신앙은 도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이 혼성된 신화적 세계인 명부에 대한 믿음이다.
신화에는 세계의 근원, 신, 자연현상, 죽음 등에 대한 옛사람들의 삶과 사유가 반영되어 있다.
저승, 즉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 상상력이 모여드는 중심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차원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속 신화의 세계 역시 인간세계를 그대로 모방한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명부에도 왕과 신하,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사자, 옥졸 등이 있다고 생각했다.
ο 명부세계의 어린아이
명부전의 동자들은 강력하고 개성 강한 존재들 틈에 끼어 있는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자상에 주목하지만 실제 동자상 중에는 미소를 띤 것보다 무표정하거나 심지어 싸늘한 느낌을 주는 것이 더 많다.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는 것이 보는 것을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평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대적인 아동 관념을 동자상에 투사한 것이 아닐까?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검을 터부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고종의 아명은 ‘개똥이’였고 인종의 아명은 ‘백돌이’였다. 어린아이는 죽음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유한 인격, 즉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전근대사회에서 아이들은 익명의 존재였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어른과 ‘같으면서도 다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아이들은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했다.
한대 이후 시동 대신 신주가 보편화되었지만, 오랫동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아들이나 손자가 제사상을 받았다.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왜 엄숙한 제사상에 앉혔는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아동의 중간자적 특징에 주목한다.
시동은 항상 그 집안의 자손 중에서 선발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조상의 특징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아직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갖지 못한, 다시 말해 개성이 전혀 없는 익명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상의 혼이 내려온다고 보았다.
시동(尸童) ::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신위(神位) 대신으로 앉히던 어린아이.
ο 지필묵을 들고 있는 동자


▶ 김룡사 동자들 – 양반가의 자제들이 입신출세를 위해 서당 교육을 받았지만 대다수 서민의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주인나라와 마님, 아기씨를 위해 나귀를 끌고 차를 끓이는 허드렛일을 도맡았다. 그래서일까, 명부전 동자들은 미소 띤 얼굴보다 무표정하거나 심지어 싸늘한 느낌을 준다.
명부전의 동자상은 불교보다 도교와 더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불교가 배척되었던 조선 시대에도 불교예술 중 보기 드물게 사실주의적 표현이 등장할 만큼 민간에서 명부신앙이 상당히 성행했던 모양이다.
지물은 불교뿐 아니라 도교와 민간신앙의 상징물까지 아우르고 있어 그 의미를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연꽃이나 연잎을 든 동자상은 연화화생(蓮華化生)을 상징하며, 꽃이나 과일을 공손하게 받들고 있는 동자상은 공양 올리는 사람을 표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너풀거리는 천의를 입고 있거나 학, 봉황, 기러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이 아이들이 천상 세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거북은 장수를, 사자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동자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물은 붓, 두루마리, 벼루 등의 필기구이다. 대부분의 참배객들은 필기구를 보고 동자들의 학습 도구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근대적인 아동의 개념을 투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이 필기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한다.
전근대 동아시아사회의 어린아이들은 필립 아리에스가 연구했던 전근대 서양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특별한 돌봄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실 세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명부전의 동자들은 노동하는 아이, 즉 시왕을 보좌하는 시동이다. 그들은 시왕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대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물을 들고 서 있는 것이다. 붓과 벼루는 시왕의 판결을 기록하는 도구이고, 아이들은 시왕의 명령을 받아 판결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명부전의 동자들은 원래 도교에서 시왕의 시중을 드는 시동이지만, 불교경전에서는 동생신 또는 동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동생신은 오른쪽 어깨 위에서 사람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일을 맡은 여자아이이고, 동명신은 사람의 왼쪽 어깨 위에서 착한 행동을 기록하는 남자아이이다. 동자는 인간의 죄상을 기록한 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는 “오관왕의 업의 저울은 공중에 걸려 있고 좌우의 두 동자는 업부를 채운다. 죄의 경중이 어찌 마음대로 되겠는가, 눈금은 전생의 인연 따라 오르내린다”라고 적혀 있다. 그들은 어떤 결정권이나 완력을 갖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살아생전 행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보관했다가 시왕들에게 보고하거나 시왕의 판결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ο 왜 아이에게 죄의 기록을 맡겼을까

▶ 해인사 국일암 지장시왕도 – 선악동자가 화면 앞의 연꽃 봉우리 속에 크게 묘사되어 있다. 지장보살의 어깨 뒤에 동자 대신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한 여성상이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동자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감추어 둔 속내를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그들이 진실을 기록할 수 있는 까닭은 가장 비천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선악동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된다. 선악동자는 고려 시대의 명부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선 시대 불화에는 자주 나타난다.
한 미술사학자는 지장보살의 어깨 뒤에 있던 선악동자가 화면 전면에 배치된 것에 대하여 조선 후기에 권선징악의 윤리가 강조된 결과로 해석한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불만은 송나라 때 관료체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행한 시왕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관료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시왕이나 저승사자들 또한 믿지 못했다. 그들 역시 관료이므로 현실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뇌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지옥행을 면해 주고 사사로운 관계에 따라 판결을 바꾸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판단이 아니라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기록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염라대왕을 그린 〈명왕도〉에서도 기록 장면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은 시왕의 인격이나 판단력보다 기록을 더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록을 담당하는 존재인 선악동자의 역할을 새삼 주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섬김의 미학과 <야콥 폰 군텐>
ο 동자, 천진함과 무표정의 사이

▶ 상원사 문수전 목조동자상 – 오늘날의 아이들과 달리 전근대사회의 아이들에게 부모와 스승이 요구한 것은 ‘복종’과 ‘섬김’이었다.
명부전의 동자들은 시왕이나 지장보살을 보조하는 시동이므로 그들의 본질은 곧 주인을 충직하게 ‘섬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생부터 ‘천진성’과 ‘순수성’, 나아가 ‘천재성’을 인정받는 오늘날의 아이들과 달리 전근대사회의 아이들에게 부모와 스승이 요구한 것은 ‘복종’과 ‘섬김’이었다.
시동이 하는 일은 전문지식이나 숙련이 필요치 않은 단순한 일인 데다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쉬운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누군가의 뜻에 맞추어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비우고 완전히 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승가에 입문한 초심자들은 스승을 시봉하는 일부터 배웠다.
붓다의 사촌이자 시자였던 아난은 그 정성스럽고 엽렵한 시봉으로 널리 칭송을 받았다. 붓다는 아난의 시봉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의 여덟 가지 덕목을 다른 시자들을 위한 귀감으로 제시했다.
『북본대반열반경』 권?40에 열거된 내용을 보면, 시자가 되려면 첫째, 신체장애가 없어야 하고 둘째, 마음이 곧고 질박해야 하며 셋째, 몸에 병이 없어야 하며 넷째,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다섯째, 주의가 산만해서는 안 되고 여섯째, 교만해서도 안 된다. 일곱째로 정(定)과 혜(慧)를 성취해야 하며 마지막 여덟째로 지혜롭게 잘 알아들어야 한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인 보살도 시동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의 부름에 응하여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시동과 같은 비천한 신분은 보살이 자신을 감추고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다.
초라한 행색이나 비천한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신여길 때 바로 그때 보살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하찮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명부전의 동자가 행하는 ‘섬김’의 수행적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소중하게 여겨졌다.
구족계 :: 불교 교단의 승려 중 비구와 비구니가 받는 계.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라 하며, 이를 잘 지키면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승려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으며, 죄과가 없는 이로서, 사미계(沙彌戒) 또는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뒤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계, 비구니의 경우에는 348계이다. 이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범어사ㆍ통도사ㆍ해인사의 계단이 유명하다.
이 계의 수계는 삼사(三師)ㆍ칠증(七證)이 배석한 가운데 계사(戒師)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수하는데, 수계자가 계를 받을 것을 청해오면 계사는 구족계의 내용을 일일이 설하여주고, 수계자로부터 하나하나의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계를 주는 형식을 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족계 [具足戒]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아난 :: 산스크리트어 ānanda의 음사. 환희(歡喜)라 번역. 십대제자(十大弟子)의 하나. 붓다의 사촌 동생으로,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후 고향에 왔을 때 난타(難陀)·아나율(阿那律) 등과 함께 출가함. 붓다의 나이 50여 세에 시자(侍者)로 추천되어 붓다가 입멸할 때까지 보좌하면서 가장 많은 설법을 들어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일컬음.
붓다에게 여성의 출가를 세 번이나 간청하여 허락을 받음. 붓다가 입멸한 직후, 왕사성(王舍城) 밖의 칠엽굴(七葉窟)에서 행한 제1차 결집(結集) 때, 아난이 기억을 더듬어 가며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붓다께서는……”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암송하면, 여러 비구들은 아난의 기억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으면 정정한 후, 모두 함께 암송함으로써 경장(經藏)이 결집됨.
[네이버 지식백과] 아난 [阿難]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시공사)
병신춤 :: 양반을 병신으로 풍자하여 추는 춤. 병신춤을 가장 많이 춘 시기는 조선시대 중엽 이후이다. 이 시기는 반상의 차별이 심하고 민중예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서민들은 놀이판에서 농악을 치고 춤을 추는 가운데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고 모욕하는 의미에서 이 춤을 추었다. 이 놀이는 밀양지방에서 전해졌으며, 양반을 병신으로 가장하여 양반과 아전들을 풍자하고 모욕함으로써 그간에 쌓인 분노와 한숨을 발산하는 서민들의 오락거리라 할 수 있다. 주로 정월 보름날이나 단오·추석 등에 양반과 마주칠 염려가 없는 다리밑이나 야외의 숲속에서 즐겼다.
등장인물은 모두 병신을 가장한 인물이다. 벙어리 내외 2명, 봉사 내외 2명, 안팎 곱추 2명 외에 절름발이·떨떨이·중풍환자·문둥이·언청이 내외가 짝을 지어 등장하는데 인원은 10∼15명 정도이다. 악기는 퉁소 같은 기본 악기 외에 나뭇잎으로 부는 치금·사장고·물장고·활장고 등 기명악기를 사용한다.
처음에는 지신밟기로부터 시작하여 마당을 돌고 난 뒤 흥이 익을 무렵이면 가장한 병신들이 선창자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 돌려가면서 차례로 독특한 장기를 부린 다음, 짝놀이로 내외간 두 사람씩 나와서 신세타령을 표현하는 춤과 몸짓으로 한바탕 논다. 그 다음에는 3명씩 짝을 지어 흥에 취한 끝에 비통한 표정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춤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전체가 흥겹게 하나가 되면서 대단원을 이룬다.
노래 가사는 주로 양반과 아전들을 모욕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가락은 중모리·중중모리·단모리·덧배기 등을 사용했다. 병신춤을 단독으로 추는 경우는 크게 밀양 백중놀이에 전하는 병신춤과 각설이패들이 각설이타령으로 추는 춤, 그리고 탈판이나 농악판에서 추는 춤으로 나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병신춤 [病身─] (두산백과)
ο 야콥은 왜 하인학교에 들어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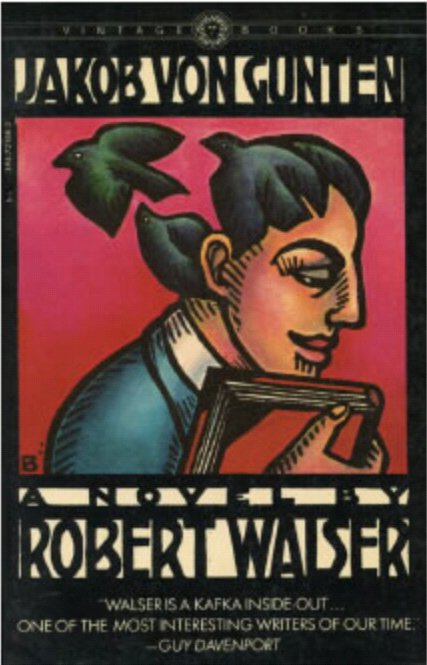
▶ 야콥 폰 군텐 – 1905년에 베를린에서 첫 출간된 이 소설은 실제 발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1905년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인 학교에 들어갔고, 다음해 겨울 집사로 일했다.
신분의 차이가 철폐되고 자유시민의 권리가 확립되었던 20세기 초, 스위스의 문학자 로베르트 발저(Robert Otto Walser)는 귀족의 자제인 주인공 야콥이 하인이 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인학교에 들어간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야콥 폰 군텐』(우리말 번역본은 『벤야멘타 하인학교』로 출판되었다)을 발표한다.
주인공 야콥은 단호하게 말한다.“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없다. 우리들, 벤야멘타 학교의 생도들에게 배움 따위는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훗날 아주 미미한 존재, 누군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뜻이다.”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학생들은 명부전의 동자들처럼 무표정하고 딱딱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이 자세를 습득하려면 면밀한 모방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벤야멘타 학교에서 하인이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실제로 가르치는 것도 없지만) 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종종 반나절이 다 가도록 늘어지는 기묘한 무위”는 고된 육체노동보다 더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벤야멘타 학교에서 진짜 배우는 것은 바로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을 푹 가라앉히는 것”,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이다.
ο “진실한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위’는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를 버려야만 배울 수 있다. 자기 의지를 버리기 위해 야콥은 자발적으로 하인이 되기를 선택한다. 하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타인의 의지에 맞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섬김’이라는 하인의 행위를 통해서 ‘무위’가 실천된다.
승가에서도 타인의 의지에 따라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은 수행의 첫 걸음이다.
구정 선사가 입산하던 날, 스승은 다짜고짜로 그에게 부엌에 솥을 걸라고 분부하고는 외출해 버린다.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솥을 걸고는 해질녘 돌아온 스승에게 보여 주자 스승은 대뜸 솥을 잘못 걸었다고 하면서 내일 다시 걸라고 명했다. 다음날 날이 밝자 행자는 다시 솥을 걸기 시작했다. 한나절에 걸쳐 열심히 솥을 걸었다. 속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되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승에게 보여 주었으나 스승은 더 크게 화를 내며 솥을 다시 걸라고 했다. 행자는 스승이 시킨 대로 군소리 없이 다시 솥을 걸기 시작했다. 이러기를 반복하여 아홉 번째가 되었을 때 스승은 비로소 솥이 제대로 걸렸다면서 행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구정(九鼎)’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스승이 제자가 제대로 수행을 할 만한 그릇인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골탕을 먹였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공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라캉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할 뿐, 전혀 주체적이지 못하다. 야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삶’을 거부하고 기꺼이 시대의 낙오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견 굴욕적으로 보이는 하인의 삶의 방식은 자신을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바꿈으로써 타인에 대해 무한히 자신을 개방한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완전히 열려 있다. 그는 이 연관성 속에서 “세계에 대한 존경과 친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삶은 굴종과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
하인은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상황의 주인’이 된다. 그의 선행은 아무 보답을 받지 못하지만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가 보살의 행으로 장엄되듯이 ‘올바른 행실은 꽃이 만개한 정원’처럼 행복으로 인도한다. ‘눈곱만큼의 이기심도 없는’ 하인학교의 학생들은 지극히 겸손하고 심지어 비굴하지만, “성급히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충직하게 일하는, 열정적이고 겸손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를 묵묵히 견딘다.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참 모습을 알게 된다. 주인공 야콥은 그 잔인한 희망의 부재를 확인하고 견뎌 냄으로써 희망을 품지 않고도 삶을 긍정한다.
발저의 소설은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야콥의 선택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근대인이 추구하는 자유와 성공이 아니라 신화의 세계 언저리에 있던 하인의 무위와 수동성에 있음을 암시한다.
언제든지 공손하게 몸을 낮추는 명부전의 동자상들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근대적 인간이 아니라 신화 속의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이지만 가장 진실하고 충직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진실한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4. 감각으로 감각을 넘어서다

▶ 관경서분변상도 – 1312년에 제작된 고려 회화로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몇 개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사세가 칼을 뽑아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자 대신들이 만류하는 장면과 붓다를 바라보며 합장한 위제희 부인과 시녀들의 모습이 정성스럽기 그지없다.
오이디푸스와 아사세의 자기 인식
ο 왕사성과 테베의 비극

▶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현명한 왕은 그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 장면은 많은 서양화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앵그르(좌)와 모로(우)의 작품.
『관무량수경』은 청정한 땅, 정토로의 구원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빔비사라 왕과 왕비 위제희 부인,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사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왕사성의 비극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늦도록 아들이 없었던 빔비사라 왕은 비프라 산에서 수행하는 선인이 삼 년 뒤에 왕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어느 점성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급한 마음에 사람을 시켜 선인을 죽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위제희 부인은 태기를 느낀다. 왕자가 태어난 후, 아이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관상가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왕은 높은 누각에서 갓난아이를 떨어뜨리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솜이불을 누각 밑에 쌓아 둔 위제희 부인의 모성애와 지혜 덕분에 살아난 아이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빔비사라 왕과 위제희 부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 아이가 바로 아사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죽이려 한 부왕의 비밀을 알게 된 아사세는 원한에 가득 차서 왕위를 찬탈하고 부왕을 깊은 궁전에 유폐시킨다. 유일하게 면회가 허락된 위제희 부인은 몸에 꿀 반죽을 바르고 매일 왕을 찾아간다. 왕비의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한 왕은 기사굴산에 있는 붓다를 향해 간절히 기원한다. 이렇게 하여 목련존자에게 팔계를 받고 부루나존자의 설법을 들은 왕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나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한 아사세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일찍이 왕위를 탐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은 있었어도 어머니를 살해한 왕은 없었다는 대신들의 간언으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위제희 부인은 궁궐에 유폐된 이후 오로지 붓다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청한다. 그 간절한 염원에 응하여 붓다가 신통력으로 위제희 부인 앞에 나타나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아버지를 죽인 대역죄를 범한 아사세는 온몸에 흉측한 부스럼이 생겨 고생하자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붓다에 귀의하여 불법을 보호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딧세이아』에서 가져온 신화를 토대로 하였지만 오이디푸스 개인의 비극적 운명과 신탁의 필연성, 그리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비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미래에 태어날 아들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 신탁의 내용이 실현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기를 불쌍히 여긴 신하에 의해 오이디푸스는 이웃 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보내지고, 왕가에 입양되어 왕자로 성장한다.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았던 오이디푸스는 성장한 후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알고는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난다. 테베로 가는 길에서 사소한 시비로 한 남자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고향 테베로 들어간다. 그때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 즉 오이디푸스의 생모는 테베를 어지럽히는 반인반수의 괴물 스핑크스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면 그와 결혼하여 왕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친어머니인 왕비와 결혼하여 두 아들과 두 딸을 낳는다.
오이디푸스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나 어느 날 역병과 가뭄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신탁을 묻는다.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한 악한이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악한이 누구인지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왕비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파내고 방랑길에 오른다.
ο 합리적 인식의 한계
“지식은 곧 권력이다”라는 베이컨의 말처럼, 오이디푸스에게 권력을 가져다준 원천은 바로 지식이다. 오이디푸스는 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인간적인 지식으로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왕으로서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했다. 이십 년이 지난 후, 다시 위기에 처한 테베를 구하기 위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할 때에도 그는 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듣고 추리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에 의존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현명한 왕은 그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인간’이라는 자기 인식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수수께끼,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악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역시 오이디푸스 자신을 향하는 질문이었다. 테베가 불행해진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한때는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준 지식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테베를 위기에서 구하여 왕이 되도록 한 지식의 추구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맹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각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파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단죄한다.
아사세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사세의 벗이자 붓다의 사촌인 데바닷타(Devadatta)가 왕사성의 비극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아사세의 왕위 찬탈은 데바닷타의 교단 분열의 시도와 결합되어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불교사에서 가장 악한 인물로 그려지는 데바닷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주의에 입각해 종교개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에 가깝다. 그가 분소의(糞掃衣)를 입고 소금이나 유제품을 먹지 않고 하루 한 끼 걸식을 하면서 숲이나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초기 교단의 유행 생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석가모니불을 비판했던 것을 보면 단순히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망보다 엄격하게 원칙을 고집하는 근본주의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융통성 없는 데바닷타가 보기에 석가모니불은 자신이 만든 계율조차 위반하는 무원칙적인 인물, 비합리적인 종교지도자였다. 따라서 붓다가 제정한 계율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불교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 점에서 데바닷타는 비록 붓다 시해를 도모한 대역 죄인이지만 원리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지성을 대표한다.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는 먼저 아사세의 신임을 얻은 다음, ‘아사세는 전륜성왕이 되고, 자신은 제2의 붓다가 되자’는 명분을 앞세워 아사세가 빔비사라 왕을 폐위하도록 적극 사주한다. 물론 그의 모반은 아사세가 붓다에 귀의함으로써 실패로 끝난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운명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것과 달리, 아사세의 부친살해와 모친유폐는 빔비사라 왕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계속되는 복수를 정당화할 뿐, 그 악행의 고리를 깨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을 낳는다.
마찬가지로 계율을 완화시키는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데바닷타의 교단 분열 시도는 언뜻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데바닷타의 비판은 계율의 조항에 얽매인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 계율은 행위를 규제하기보다 주체적으로 반성하고 자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승가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에서는 계율에 대한 집착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사로운 욕망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결국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이 작품은 서양의 이성주의와 그 한계에 대한 최초의 경고로 해석된다.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자기 인식은 비극의 출발점이지만, 아사세의 이야기에서 자기 인식은 더 많은 증오와 복수,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아사세뿐만 아니라 데바닷타에게도 합리적 인식은 결국 자신의 근원인 아버지와 붓다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스트모던적 지식론에 따르면,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지식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오이디푸스에게도, 아사세에게도, 데바닷타에게도 그것은 더 큰 비극을 안겨 줄 뿐이었다.
『오이디푸스 왕』이 스스로 운명과 그 운명이 초래한 비극적 고통을 떠맡는 자기 결정을 통해 인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관무량수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관무량수경』의 16관법
ο 범람하는 이미지

▶ 관경십육관변상도 – 범람하는 이미지 한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감각을 구제하는 길은 무엇일까? 역설적이게도 감각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각의 지멸이다. 1323년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일본 지은원 소장.
이제 가상과 진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고 더 익숙해졌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이미지들은 감각을 일깨워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과도한 이미지 때문에 전례에 없던 감각의 혹사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디지털이미지는 ‘파편처럼 단편적인 양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적이다.
역설적이게도 감각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각의 지멸(止滅)이다. 따라서 아사세에 의해 궁전에 유폐된 위제희 부인이 붓다에게 하늘에서 내려와 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붓다가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이다.
ο 감각으로 감각을 구제하는 16가지 방법

▶ 관경십육관변상도 세부 –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누각과 비파, 장고, 피리 등의 악기가 끈에 묶인 채 떠 있어 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극락세계에서 소리와 이미지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마음을 흐리는 방해꾼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수단이 된다.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의 제1관은 바로 저무는 해를 관상하는 일몰관(日沒觀)이었다. 일상관(日想觀)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법은 감각을 통해 감각을 사라지게 한다. 빛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삼라만상의 현상적인 차별을 드러내기 때문에 태양의 저묾은 곧 각양각색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현상세계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지는 해와 함께 조용히 어둠이 찾아오면, 감각도 사라지고 수많은 이미지로 형성된 차별적인 현상세계도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마음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적멸의 세계로 들어가 깊은 휴식을 경험한다.
그런데 위제희 부인이 왕생하기를 희망했던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모든 차별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세계가 아니다. 그곳은 가장 즐거운 세계, 따라서 무의식에 침잠한 무(無)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잦아들고 맑고 명징한 정신이 깨어나면, 태양이 저문 그곳이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맑고 투명한 빛의 세계였음이 드러난다.
제2관으로 맑고 투명한 물을 관상하는 수상관(水想觀)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면, 명징한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투명하게 안팎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빛으로 가득 찬 아미타불의 세계, 극락정토는 모든 존재가 찬연하게 빛나는 세계이다. 하나의 근원에서만 빛이 유출되는 사바세계와 달리 극락세계는 무한한 빛의 붓다인 아미타불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빛을 내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빛 물결 가운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일미평등(一味平等)한 법계가 펼쳐진다.
제3관인 지상관(地想觀)은 수상관을 분명하게 관하여 그 영상이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이 땅을 관하는 사람은” 이 관법을 통해 삼매를 얻으면 불국토를 분명하게 보아 “80억겁 생사의 죄를 면하게 되고 죽은 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전한다.
따라서 극락세계에서 감각은 억제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비추는 진실한 것이다.
감각은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맑고 또렷하게 꿰뚫어 보고, 현상세계에서 ‘무상, 고, 무아’를 깨닫고,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 수행자를 기억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극락세계에서 소리와 이미지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마음을 흐리는 방해꾼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수단이 된다.
제7관 화좌상관(華座想觀)과 제8관 상상관(像想觀)은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아미타불을 관상하고, 좌우에 있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때 무량수불이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형상은 실재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다. 하지만 한 번 붓다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한 번 붓다가 되고 두 번 붓다를 생각하면 내 마음도 두 번 붓다를 닮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붓다와 국토를 상상하면서 내가 진실하게 붓다를 맞으러 가면 붓다가 나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제9관 진신관(眞身觀)을 통해 마침내 아미타불을 보고 이어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만난다.
제12관 관상법인 보관상관(普觀想觀)은 자신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연꽃 속에 결가부좌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연꽃 속에서 하늘에 가득 찬 불보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다. 이 단계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제13관 잡상관(雜想觀)은 아미타불이 신통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어떤 때는 큰 몸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일장육척의 작은 몸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는 상상의 이미지와 진짜 아미타불이 진실로 하나가 되어 극락세계가 모두 아미타불의 광명에 조응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 광명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극락세계에 대한 관상이 끝나는데, 이를 정선(定善)이라고 하여 일정한 수행을 거친 자들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
남은 세 가지 관법은 상·중·하의 자질에 따라 염불하는 것인데, 부모를 죽이거나 탑이나 절을 파괴하는 등 큰 죄악을 저지르거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열 가지 악업을 저지른 흉악한 자들도 임종 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80억겁의 죄악을 용서받고 극락왕생한다. 그 후 12대겁이 지나면 비로소 연꽃이 피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기쁨을 얻는다. 이를 산선(散善)이라고 한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지극한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무량수경』에 소개된 극락세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열여섯 가지 관법은 일반적인 명상 수행과 달리 감각을 부정하지 않는다.
불국토는 붓다의 지혜로 이룩한 세계이다. 따라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본래의 목적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이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불교는 번뇌에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관무량수경』의 16관법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관세음보살, 소리로 마음을 보다
ο 소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 운문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 미적 관조는 공간, 시간, 인과성에서 해방된 오로지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이며 ‘명석한 거울’이다. 순수한 미적 체험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처럼 고통과 슬픔에 깊은 위로를 가져다준다.
세상의 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부르는 곳마다 달려가서 고통을 씻어 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이를 관세음(觀世音)보살이라고 부른다.
천의 눈과 천의 팔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습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대문호 소식(蘇軾)이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의 두 눈과 두 팔은 보고 듣는 데 정신이 팔려 세상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천의 눈과 천의 팔이 하나의 눈과 팔이 되어 모든 분별을 버리고 일심으로 응하기 때문이다.
소리가 고통인 것은 소리 자체의 운명이 아니다. 거기에 얽혀 있는 자기가 소리를 괴로움으로 만든다. 소리가 자기 소리인 한, 그것은 고통의 표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소리로써 대답하는 것은 괴로움에 대하여 괴로움으로 대답하는 것이며 자기와 또 다른 자기가 대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는 대립과 투쟁의 산물이며 마음을 혼탁하게 할 뿐이다. 소리를 맑히려면, 그리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소리가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추호도 자기 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ο 소리를 따라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다

▶ 여수 흥국사 원통보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습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천의 눈과 천의 팔이 하나의 눈과 팔이 되어 모든 분별을 버리고 일심으로 응하기 때문이다.
소리가 소리를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리의 순수성으로, 소리 그 자체로 돌아감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해 소리가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무화될 때 침묵의 소리는 내면으로 침잠할 수 있다.
소리를 따라 침묵의 세계, 적묵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 역설이다.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돌이켜 자성을 깨닫는 ‘반문자성(反聞自性)’을 통하여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얻었다.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그치고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열어 놓음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수행하기를 권했던 것은 소리에는 안과 밖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바깥에만 있는 색이나 모양을 통한 수행보다 소리를 듣는 수행이 인간에게 더 쉽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눈을 감고 귀를 막음으로써 바깥세상의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의 상태를 얻는 것은 이승(二乘)의 하열한 근기나 하는 수행이지, 예로부터 선가의 수행자들은 세상의 모든 경계와 모든 소리에 자신을 열어 둠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감각 능력이든 하나를 끊으면 일체를 끊게 되고 하나를 증득하면 일체를 증득하게 된다.
향엄 스님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쳐 나는 ‘딱’ 소리에 크게 깨달았고, 서산 대사는 마을을 지나다 대낮에 닭이 홰를 치며 크게 우는 소리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또 한암 스님은 입선을 알리는 죽비 소리에 크게 깨쳤다. 그들에게 소리는 귀를 멀게 하는 미망의 근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연(機緣)이었다.
자기 소리도 세상의 소리도 사라지고 듣는 사람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몸도 없고 대나무도 없는 경계에서 소리는 모든 시간과 단절되어 영겁의 순간에 멈춘다. 이제 소리는 소리이기를 그치고 사물과 자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한 점의 티끌도 없는 순수의식의 상태에서 소리는 있는 그대로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산하대지가 모두 명징하게 지각된다. 맑고 텅 빈 마음은 물건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붙잡지 않고 비추는 거울처럼 세상의 모든 사물을 비춘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이기적 목적이나 분별이 없이,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텅 비어서 맑고 담담하며 고요한 그 마음은 바깥세상의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다. 관조한다는 것은 이처럼 순수한 주시, 즉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듣는 것을 말한다.
소식이 〈참요 스님을 보내며〉에서 읊었던 것처럼 “고요하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깨닫고 텅 비어 있기에 만 가지 경계를 받아들인다.” 이제 소리는 바깥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의 소리가 아니라 근원적인 마음의 현현이다.
ο 쇼펜하우어의 ‘무관심적 관조’와 관세음보살의 구원
쇼펜하우어의 ‘무관심적 관조’는 자기를 잊고 소리에서 자성을 깨닫는 선적 체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의 충동에서 발생한 것이며 의지는 욕구, 결핍, 고통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결핍과 고통은 현세에서 결코 해소될 수 없지만 무관심적 관조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관조는 자신을 잊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무관심적’이라고 명명하고 미적 관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았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번뇌와 욕망, 분별적 사유로부터 벗어난 현성(現成) 경계처럼, 미적 관조는 공간, 시간, 인과성으로부터 해방된, 오로지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이며 ‘명석한 거울’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예술만이 순수한 관조를 통해 파악된 영원한 이념들을 표상”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의 충동에서 벗어나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즐거움과 달리 이기적 관심이나 목적의식에서 벗어난 순수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고(苦)의 현실로부터 구원을 약속한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에 대한 미적 관조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원의 힘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관세음보살의 구제와 비교된다. 비록 관세음보살의 자비처럼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苦)로부터의 해방과 위로를 가져다줄 뿐이지만, 순수한 미적 체험은 종교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처럼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은 위로를 가져다줄 것이다.
사물, 소리가 주는 정화의 힘
ο 소리의 끝은 침묵

▶ 상원사 동종 주악비천상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인 상원사 동종에는 천의 자락을 흩날리며 공후와 생황을 연주하는 비천상이 새겨져 있다.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소리가 주는 정화의 힘, 삶의 고(苦)를 잠시나마 잊도록 하는 힘은 종교적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술적 경험으로도 느낄 수 있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처럼 음악이 주는 위안은 어떤 예술 장르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쇼펜하우어 미학에서 음악은 이념을 모사한다고 알려진 다른 예술장르와 달리 현상세계 배후에 존재하는 물자체인 의지를 모사한다. 따라서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장르보다 강력하게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을 잠재우고 이기적 욕망이나 사념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상태에서 주관은 ‘순수하며, 의지와 고통이 없고, 비시간적인 인식의 주체’로서, 즉 완전한 망아(忘我)의 상태에서 대상의 개별적인 모습에 몰입하여 구체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된다. 이처럼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순수한 인식의 상태를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심 또는 삼매라고 한다.
모든 종교음악은 음악을 통한 구원을 지향한다. 절집에서는 뭇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아침저녁 예불 때마다 사물四物을 쳐서 소리를 울린다.
ο 내면의 소리, 범종

▶ 여수 흥국사 범종 – 누구 그랬던가? 붓다의 목소리를 해조음이라고. 쏴하고 밀려왔다가 쏴하고 밀려가는 파도 소리처럼 범종의 크고 고요한 소리는 귓전에다가와 은근하게 마음을 감싸 준다.
사물 :: 범종, 법고, 운판, 목어
아침저녁 예불 시간과 사시마지(巳時麻旨)때 타종하는 범종은 안에서 밖으로 퍼져 가는 서양의 종소리와 달리 바깥에서 안으로 소리를 모아 진동하면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묵직하고 낮은 소리를 낸다. 특히 우리나라 범종은 대나무 모양의 음관이 있어서 음색이 맑고 그윽하다.
칸딘스키가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감상하다가 음 하나하나가 색채로 보이는 경험을 한 것처럼.
놀랍게도 비천상에는 날개가 없다. 가냘프고 호리호리한 몸매와 휘날리는 천의만으로 가볍게 날아온다.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했던 서양 사람들과 달리 동양 사람들은 몸을 가볍게 하면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천상〉, 특히 〈주악비천상〉은 범종을 비롯하여 법당의 천장, 처마 밑, 그리고 수많은 불화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ο 목어와 운판

▶ 운문사 목어 – 수중 생물을 구원하는 목어의 소리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졸지 말고 수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여수 흥국사 운판 – 운판의 소리는 날짐승과 떠도는 영혼을 구제하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 무늬의 운판에 해와 달, 그리고 천녀 두 명을 대칭시키고 있다.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과 단순한 구도가 잘 조화된 운판이다.
수중 생물을 구원한다는 목어의 소리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졸지 말고 수행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목어와 마찬가지로 물고기 모양을 형상화한 목탁은 크기가 작아 의례 집전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이른 새벽 스님들이 도량석(道場釋)을 하며 목탁을 치듯 어두운 세상에 목탁 소리는 항상 깨어 있도록 우리를 경책한다.
운판의 소리는 날짐승과 떠도는 영혼을 구제한다고 하는데, 운판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이나 해와 달, 또는 용이나 비천상이 새겨져 있거나 ‘옴마니반메훔’ 같은 진언이 새겨져 있다.
ο 법을 전하는 소리, 법고

▶ 여수 흥국사 법고 – 법고를 받치는 버고대는 거북, 해치, 사자 등 상서로운 동물이나 연꽃의 형태로 조각된다.
법을 전한다고 하여 법고라고 부른다. 예불뿐 아니라 각종 재를 지내거나 의례를 행할 때 사용되는데, 쇠가죽을 이용하기 때문에 축생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덧붙었다. 법고를 받치는 법고대는 거북, 해치, 사자 등 상서로운 동물이나 연꽃의 형태로 조각된다.
소리가 소리를 무화시켜 오직 순수한 의식만 있을 때 지옥의 고통은 사라지고 열반의 즐거움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시대의 소리는 점점 혼탁해지고 대중문화의 쾌락적 가상 속으로 고苦의 현실을 은폐시키고 있다. 진정한 예술은 고통을 은폐하지 않고 삶의 진실을 잃지 않게 한다. 한갓 잠깐의 휴식일지라도 지난한 삶의 노정에 고마운 쉼터가 된다.
5. 진상과 가상
천백억 석가모니불
ο 왜 그렇게 많은 붓다가 존재할까

▶ 직지사 천불 – 천불은 누구든지 깨달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근본사상을 상징한다. 천불 중에는 특별히 나와 인연이 깊은 붓다가 꼭 하나는 있다고 한다. 예배를 드리고 눈을 들어 천불상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붓다이다.

▶ 그리스 신들 – 그리스의 최고신인 제우스(우) 조차도 아내인 헤라(좌) 여신에게 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늘의 신인 제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포세이돈은 땅의 신 데메테르를 어쩌지 못한다. 술과 음악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하루도 멀쩡한 날이 없다.

▶ 직지사 천불 – 우주는 붓다로 가득 차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가 존재하며 이름이 다른 수많은 붓다가 있다. 그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 고립돈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증명한다.
원형의 공간구성 방식은 유일신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위계질서가 정해지는 기독교 신학과 잘 맞지 않는다. 원형은 내부의 모든 공간을 균질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어떤 한 지점도 특권적인 장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테온 역시 지금은 가톨릭 성당이지만 원래는 로마의 신들을 위한 만신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원형을 이교도의 건축양식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그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셈이다.
불교에서는 붓다가 천 명, 만 명, 나아가 ‘천백억 석가모니불’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불교에서 붓다의 복수성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탁월함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한다.
붓다는 천불, 만불이 있어도 서로 차별이 없다. 그와 달리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은 이름과 역할, 능력과 위상이 서로 다르다. 그들은 천상 세계에 거주하며 인간보다 힘이 세고 더 오래 살지만 그들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하지만 제우스조차도 아래 등급의 신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심지어 아내인 헤라 여신에게도 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신세이다. 그들이 관장하는 영역도 제한이 있어서 하늘의 신인 제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포세이돈은 땅의 신 데메테르를 어쩌지 못한다.
이와 달리 붓다는 신도 아니며 인간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과 신의 단계를 초월한 존재이다. 사실 ‘존재’라는 말도 맞지 않다. 깨달음을 이루면 누구나 여래(如來),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 과거와 현재의 무수한 존재들이 그렇게 붓다가 되었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중생들도 그렇게 붓다가 될 것이다. 또한 동방과 서방, 남방과 북방, 그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붓다가 된다.
그러므로 우주는 붓다로 가득 차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가 존재하며 동서남북 위아래의 모든 방위에 붓다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수많은 붓다가 있으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붓다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한다.
불상 조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찰 규모가 제법 큰 사찰 가운데 대웅전에 주존불만 놓은 사례는 거의 없다. 제약 없이 한 명이든 일곱 명이든 원하는 대로 붓다를 그려 넣을 수 있는 불화와 달리, 조각은 그 조성의 어려움이나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천불이나 만불을 조성한 경우는 적었다. 둔황의 천불동이나 화순 운주사는 드물게 천불이 조성된 곳인데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조성해 가다 보니 천불이 되었던 것이다.
가장 많이 조성되는 형식은 중앙의 주존불과 좌우의 협시불, 또는 협시보살로 이루어지는 삼존불이다.
본존불, 협시불
ο 붓다 속의 붓다
너무 흔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교만의 독자적인 성상 배치 형식이다.
아미타삼존상의 경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때로는 지장보살이 쌍을 이루어 조성되는데, 그들은 아미타불이 원력으로 건설한 극락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들이지만 그 자체로 아미타불의 자비와 구원의 힘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붓다의 지혜와 실천을 상징한다.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미륵보살을 비롯한 이 모든 보살들은 붓다의 중생 구제의 원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협시보살들은 본존불의 보조자가 아니라 본존불 그 자체이며 본존불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은 체(體)이며 영원한 현재이며 ‘예부터 변치 않는 본질’이기 때문에 근본의 장소인 정중앙에서 부동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본존불이 방사하는 빛에 의해서 비로소 협시보살들은 본존불을 비추고 모든 존재들을 비춘다. 그러므로 삼존불은 전체와 부분, 중심과 주변, 그리고 체와 용(用)이 서로 의지하면서 삼투하는 법계의 조형적인 표현이다.
근본적으로 붓다에게는 시간이라는 차원이 없다. 붓다가 반열반(般涅槃)에 든 것은 붓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라짐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붓다는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삼세의 붓다도 다 허망한 이야기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현재의 마음도 없고 과거의 마음도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삼세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세불이 이야기하려는 뜻은 다른 데 있다.
연등불은 전생의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준 분이다. 그는 석가모니불이 보살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했는지 그 현장을 지켜보았다. 용수(龍樹)가 말했듯이 붓다의 몸은 무한한 과거 생을 통하여 실천한 자비로운 행위의 결과이다. 연등불은 과거에 이미 수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붓다의 현재의 몸이 그 공덕과 자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석가모니불 옆에 있는 것이다.
미륵불은 그 공덕과 자비의 무한함을 보여 준다. 미래가 오더라도, 붓다가 열반한 후에도 붓다는 변치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석가모니불의 또 다른 분신인 미륵불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시이고, 일시가 과거, 현재, 미래이다.
법신사상과 불상
ο “오라, 비구여!”

▶ 해인사 비로전 비로자나불 – 붓다는 출생이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은 법에 의해 붓다가 되었다. 붓다를 붓다로 만든 본질은 바로 그가 깨달은 법이다.
삼귀의 ::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일. 삼귀 또는 삼귀례(三歸禮)라고도 한다. 즉 석가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교단에 귀의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삼귀의는 원시불교 이래 수계식(受戒式) 등 여러 의식에서 실행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남아시아의 불교에서는 팔리어(語)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스님들께 귀의하나이다"를 세 번 가창한다. 한문으로는 여러 형식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歸依佛兩足尊)", "일체의 탐욕을 벗어난 가르침에로 귀의합니다(歸依法離欲尊)", "모든 무리 중에서도 존귀한 승단에 귀의합니다(歸依僧衆中尊)"의 삼귀의 계문(戒文)을 합송한다. 아비달마(阿毘達摩) 불교의 《구사론(俱舍論)》은 삼보에 귀의하는 취지에 대하여 구제(救濟)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즉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하고자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승의장(大乘義章)》은 ① 생사의 악·불선(不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② 열반을 희구(希求)하여, ③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삼보에 귀의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함께 생각하는 대승불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삼귀의는 《대지도론(大智度論)》 《보성론(寶性論)》 《불지경론(佛地經論)》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비롯한 많은 논서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대승기신론》은 귀의를 귀명(歸命:목숨을 바쳐 돌아가나이다)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귀의나 귀명이 산스크리트의 나마스(namas:南無로 음역)의 번역이지만, 이것은 삼보에 대한 경외(敬畏)와 의존, 예배와 복종,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난 주체적 자각을 나타낸다. 신라의 원효(元曉)는 저서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이를 인간에 있어 비할 바 없이 귀중한 목숨을 들어 일심(一心:하나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간다[還源]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객관적 대상에 대한 외적·형식적 태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 주체성에 대한 내적·실질적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귀의 [三歸依] (두산백과)
붓다와 붓다가 가르친 법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이 불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사실상 불교에는 형식적인 입문 절차가 없다. 출가자를 위한 입문 의식과 절차가 『율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붓다가 살아 있을 때에는 “오라, 비구여!”라는 한마디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출가자와 달리 재가자의 경우에는 그저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면 불자가 된다.
그런데 붓다가 열반한 후, 삼귀의 중 붓다에 대한 귀의가 문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법과 승가와 비교해 볼 때 이미 열반에 든 붓다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교주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그런 역할을 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때에 예수에 대한 귀의가 분명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성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말하는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신격화가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붓다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아 있는 붓다조차 그 육신은 제한되고 허망한 것이니 붓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32상과 80종호조차 그 본질이 아니다. 설사 붓다가 신통력으로 원하는 곳에 몸을 나타내더라도 그것은 가상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귀의해야 할 귀의처가 아니다.
붓다가 입멸하고 백 년 정도 흐른 후 그의 가르침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부파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론되었다. 붓다의 색신(色身)은 허망하지만 붓다를 붓다로 만드는 것, 즉 붓다의 본질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붓다는 출생이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은 법에 의해 붓다가 되었으므로 붓다를 붓다로 만든 본질은 바로 붓다가 깨달은 법이다. 이처럼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에 대한 귀의는 붓다가 깨달은 법에 대한 귀의에 다름 아니다.
ο 붓다의 덕성을 표상하는 불상
이로부터 ‘법신(法身)’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만들어졌다. 법신, 즉 ‘진리의 몸’은 붓다 그 자체, 가장 진실한 붓다를 의미한다. 모든 존재는 붓다가 될 가능성, 다시 말해 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있는 법성이 실현될 때 우리는 붓다와 같이 ‘진리의 몸’을 이루게 된다.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 곧 ‘지혜의 완성’은 법성으로서의 공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신은 가장 진실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몸인 동시에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리라”는 『상응부경』의 이야기나 “여래가 법을 공양하기 때문에 법을 공양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공경하는 것이며 법을 관찰한다면 곧 나를 보는 것이며 법이 있으면 곧 내가 있느니라”는 『증일아함경』의 말은 법과 불이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법신사상의 새로운 점이라면 법을 제법(諸法),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구성요소로 이해하기보다 지혜와 자비라는 붓다의 구체적인 덕성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자비의 화신인 붓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날 리 없다는 생각은 붓다의 열반이 단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불멸하는 존재, 영원한 현재를 표상하는 법신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역사적 존재인 석가모니불보다 더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신은 역사적 존재인 고타마 싯다르타의 신격화가 아니라 불법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불상의 조성은 법신사상의 출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기원후 1세기 무렵 인도 간다라 지방과 미투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불상이 인도 문화의 자생적인 발전 결과이든 헬레니즘 문명과의 교섭 결과이든 붓다의 입멸 후 5백여 년 동안 불상이 없던 무불상시대가 지난 다음에 출현한 불상은 불교 사상과 실천의 변화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불상의 제작이 대승불교의 출현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무불상시대에 붓다의 색신 대신 불교 조형물 속에 묘사된 보리수, 붓다의 발자국, 빈 대좌, 법륜 따위는 붓다의 색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보여 준다.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같은 일본 불교학자도 붓다 사후 수세기 동안 붓다의 육신에 대한 존경이 사리를 보관한 불탑에 대한 숭배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법신에 호소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정신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실존한 붓다의 존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역설적이게도 법신에 대한 사유가 붓다의 형상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금기를 깨뜨린다.
불상은 붓다의 덕성을 가상의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상한다. 덕분에 우리는 진리의 몸, 법신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형상은 그림자, 가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변화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돌부처님, 흙부처님, 나무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붓다의 몸짓, 수인
ο 꽃을 든 손

▶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수인 – 수인은 우주를 아우르고 모든 생명을 거두는 붓다의 자비를 나타낸다. 열 개의 손가락이 맺는 손짓이 때로 두려움을 없애주고 때로 소원을 들어주고 때로 성난 코끼리를 멈추게 한다.

▶ 다양한 수인 – 시계방향으로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중품상생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항마촉지인, 아미타불이지만 수인이 서로 안 맞는 대표적인 경우.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불상의 대표적인 수인이다.), 해인사 국일암 비로자나불(지권인), 탄생불(호림미술관 소장), 미황사 도솔암(하품중생인), 서산마애삼존불(시무외인과 여원인). 문화재청(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탄생불)
2천 5백여 년 전 인도 영축산, 산 정상에 오른 붓다는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중들은 붓다의 설법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따라 붓다는 가만히 좌중을 둘러보고는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대범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꽃을 바치며 붓다에게 법문을 청했다.
붓다는 아무 말 없이 대범천왕이 바친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여 주었다. 이때 멀찍이 대중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마하가섭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붓다가 말했다.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제 가섭에게 맡기노라.”
이 날, 두 사람이 나눈 미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연꽃을 들어 보인 붓다의 몸짓은 불멸의 몸짓이 되었다.
많고 많은 불상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선, 불상의 자세로 구별할 수 있다. 비스듬히 누워 한쪽 손으로 머리를 괴고 있는 불상이 있다면 그것은 열반상이다. 한 손으로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서 있는 불상이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탄생불이다. 크기도 작고 주로 부처님 오신 날 관불(灌佛)의식에 사용되는데, 석가모니불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사자후를 한 데서 유래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불상들은 연화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럴 때 우리는 불상이 취하고 있는 제각각 다른 손짓을 근거로 어떤 불상인지 알아낼 수 있다.
왼손 집게손가락을 펴서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서로 대고 있다면 비로자나불이다. 결가부좌한 자세에서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얹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석가모니불을 표시하는 수인이다.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불이 자신이 마라의 훼방을 물리쳤음을 증명하기 위해 땅의 신을 가리키는 손짓이다.
그리고 어떤 불상이 구품화생을 표시하는 미타정인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 아미타불이다.
ο 사나운 코끼리를 멈추게 한 것

▶ 카페 뮐러 – 피나 바우쉬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 잠옷을 입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그의 마른 몸과 앞으로 내민 팔은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몽환적이며, 출구를 찾지만 반복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그의 움직임은 대인의 처절한 자화상이다.
데바닷타의 모략으로 술 취한 코끼리가 붓다를 해치려고 돌진한 적이 있었다. 그때 붓다는 가만히 서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 손바닥을 활짝 폈다. 순간 그 기세에 눌려 코끼리가 멈추어 섰다. 그 후 이 손짓은 모든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 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시무외인(施無畏印)’이라는 불멸의 몸짓이 되었다. 그런데 이 동작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한 몸짓이지만 누구나 코끼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 손짓은 붓다이기에 가능한 것, 다시 말해 이 몸짓을 만든 것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다.
중국 불교의 체용(體用)논리를 몸과 몸짓에 적용하면, 불상의 몸은 적정삼매의 깨달음을, 불상마다 다른 몸짓(손짓)은 붓다의 자비와 방편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수인은 우주를 아우르고 모든 생명을 거두는 붓다의 자비를 나타내는데, 열 개의 손가락이 맺는 손짓이 때로는 두려움을 없애 주고 때로는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 성난 코끼리를 멈추게 한다. 탄트라불교 전통에서는 왼손은 지(止)를, 오른손은 관(觀)을 상징하거나 정(定)과 혜(慧), 권(權)과 실(實), 자(慈)와 비(悲)를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붓다의 첫 번째 제자 중 한 사람인 아설시와 사리불의 만남은 불교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장면이다.
왕사성 근처에서 산자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목건련과 함께 수행하던 사리불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탁발을 하던 아설시를 마주친다. 눈을 돌려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걷는 아설시의 모습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예사롭지 않았다. 사리불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오롯하게 걷는 아설시의 거동을 보고 생각했다. ‘대체 어떤 분의 제자이기에 저 젊은 수행자의 몸짓이 저토록 깊고 그윽할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리불은 아설시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아설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리불을 향해 몸을 돌려 나직이 대답했다.
“저의 스승은 석가족의 태자로, 왕궁을 떠나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 분입니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그 분은 어떤 법을 가르칩니까?”
“저는 아직 깊은 법을 알지 못하지만, 스승께서는 항상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스승이신 붓다는 이 인연을 가르치고 이 인연이 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설시의 대답은 사리불에게는 경천 지동하는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이었다. 감격한 그는 곧장 목건련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목건련과 함께 산자야를 따르던 오백 명의 수행자를 이끌고 붓다에게 가서 귀의하게 된다. 사리불과 목건련의 스승이었던 산자야는 이 일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고 만다.
이 일로 불교 승단은 일시에 팽창하는데, 이 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바로 아설시의 몸짓이다. 사리불의 사려 깊은 안목은 아설시의 몸짓에서 탁월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명징한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아보았던 것이다.
고대 인도 연극의 신체 표현 기법을 규정한 교범서 『표현의 거울』에서 지적했듯이 손이 가는 곳에 시선이 따라가고, 시선이 가는 곳에 정신이 향하게 되며, 정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드러난다.
감은 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소한 차이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작은 몸짓 하나에도 마음이 깃들기 때문이다.
몸은 마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최근 들어 이성 중심의 서양철학의 한계를 자각한 일련의 철학자들에 의해 몸의 철학,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철학적 가치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동양에서 몸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에서 몸과 마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유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중국 예술이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의 묘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인도 예술에서는 손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점이 흥미롭다.
인도 종교에서 인간의 몸은 신을 현현하는 그릇이며 몸짓은 종교적 경험을 강화하는 제의적인 수단이었다. 인도인들은 몸을 정신적 수행의 방해물이 아니라 엄청난 통찰력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자세와 수인의 힘을 활용하는 요가나 탄트라 같은 수행법을 개발했다. 특정한 몸의 자세는 정신적 의미와 신체적 효과를 가진다. 이처럼 의도된 효과를 가져다주는 몸짓을 ‘수인’ 또는 ‘무드라(Mudra)’라고 부른다. 도장처럼 인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시바교와 탄트라불교에서는 강력한 주술적 힘을 발휘하며 깊은 선정의 상태를 표시한다. 수인을 맺으면 불보살의 힘을 느끼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결인(結印)이라고도 한다. 탄트라불교에서 수인은 삼밀(三密) 수행, 다시 말해 몸으로는 수인을 짓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며 마음으로 삼매에 드는 세 가지 비밀한 수행법의 하나로, ‘삼밀상응 즉신성불(三密相應 卽身成佛)’, 즉 몸과 말과 생각이 상응하면 바로 성불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 몸짓은 일종의 언어였다. 인도 전통춤의 108가지의 손짓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신성한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인도에서 춤의 근원은 ‘도구 중의 도구’인 손짓에 있다. 그것은 수화처럼 정확하고 세밀한 기호 체계이며 브라만 계층과 상류층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상징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면모를 무한하게 표현하며 신성한 근원을 드러내는 신적인 것의 현현이다.
ο 원본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은 시대
밀란 쿤데라의 소설 『불멸』은 지극히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불멸을 이야기한다. “그 몸짓 덕택에,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그녀 매력의 정수가, 그 촌각의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는 여주인공 아네스가 고개를 돌리며 손을 들어 올리는 몸짓처럼 어떤 사람의 독특한 몸짓이 누군가의 기억에 새겨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키치가 빚어낸 이미지들이 지배하는 이마골로지(imagology)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듯이, 몸을 잊어버린 몸짓이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자아마저 타인의 눈에 비친 이미지로 해체된 시뮬라크르의 시대에 우리는 불상의 수인을 알았다고 만족하며 떠나는 사람들처럼 붓다의 몸짓으로 그 몸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적멸의 상징, 불탑
ο 미술사가들이 좋아하는 감은사지 석탑

▶ 감은사지 석탑 – 많은 미술사 연구자들이 감은사지 석탑을 가장 좋아하는 불교 조형물로 꼽는다. 텅 빈 폐사지에 우뚝 솟아 있는 두 개의 탑은 그 어떤 거대한 축조물보다 더 웅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절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가 줄지어 나는 듯하다.”
『삼국유사』에 묘사된 신라 서라벌의 풍경은 그야말로 붓다의 나라, 불국이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는 문무왕을 위해 신문왕이 감은사를 세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왜병을 진압하고자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은 끝내 완공하지 못하고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아들 신문왕이 절을 완공하고 본존불을 모신 금당 뜰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했다고 한다. 문무왕의 유언으로 그의 유골을 간직해 둔 곳을 대왕암이라고 하고, 절 이름은 감은사(感恩寺)로 지었다.
ο 붓다의 열반과 탑

▶ 산치대탑 – 반구형 분묘로 아쇼카 왕이 세운 가장 오래된 진신사리탑이다. 붓다의 모습은 보리수나 발자국 등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불탑은 원래 중생들의 이야기를 담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 불탑은 붓다의 사리를 보관하는 조형물로, 붓다의 열반 이후 그의 사리를 여덟 나라에 나누어 탑을 세워 봉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탑 또는 탑파의 산스크리트어 원어인 스투파(stūpa)는 분릉(墳陵), 탑묘(塔墓), 귀종(歸宗), 대취(大聚)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탑은 고대 인도의 분묘 형식을 차용하여 거기에 기념비적 성격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탑은 붓다가 허락한 유일한 상징물이다.
『대반열반경』은 붓다 입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난다여! 지금 이렇게 이 한 쌍의 사라나무는 아직 제철도 아닌데 꽃이 피어 그 꽃잎이 여래의 온몸에 한들한들 흩날리며 내려와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또 허공에서는 천상에서만 피는 만다라바 꽃이 한들한들 흩날리며 여래의 온몸에 내려와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천상의 전단분향도 한들한들 흩날리며 여래의 온몸에 내려와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천상의 악기가 허공에서 울려 퍼지면서 여래를 공양하고, 천상의 음악도 들려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그러나 아난다여! 절대 이런 일만 여래를 경애,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일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와 비구니, 재가신자, 여성 재가신자가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에 수순하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이 여래를 경애,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들은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리에 수순하며 행동하자’라고, 아난다여! 이렇게 배워야 한다.”
붓다는 자신이 승단을 지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며 임종을 앞두고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출가자 각자는 자신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당시 바라문 사제처럼 신에게 공양하는 의식을 집전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계율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다시 말해, 불교는 교주를 신성시하여 숭배하거나 절대화한 종교가 아니라 교단의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였다.
교단의 권위는 신성에 의해 주어지거나 특수한 지위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의 결과로서 주어졌다. 따라서 붓다만 아니라 일정한 수행 과위에 오른 수행자도 붓다를 대신하여 설법을 했다.
그러므로 붓다가 열반했을 때, 제자들은 붓다를 대신하는 어떤 권위적 체계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ο ‘와서 보라’

▶ 봉정사(위)와 순천 선암사(아래) - 우리나라 석탑은 단순한 구조이지만 장중하고 조형적으로 빼어나다. 번화한 사거리에서 사원 안으로 들어온 불탑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 가르침을 베푼 붓다를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붓다의 길을 걸어 보도록 권하는 초대이다.
탑은 어떤 대상을 신성시하고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가졌던 정신적 고매함을 추모하고 그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건립된 조형물이다.
훗날 사리 분실의 위험 때문에 탑이 사원 안으로 옮겨지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붓다를 기리고 그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도록 번화한 사거리에 세워졌다.
귀의자들에게 불탑은 단순한 분묘가 아니라 붓다의 상징이다. 이런 생각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 붓다고사(Buddhaghosa)의 시대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
아쇼카 왕의 통치 아래서 인도 전역에 8만4천여 개의 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와 함께 신도들 사이에 퍼져 있던 불탑신앙에 출가비구도 동참한다. 『열반경』에서 출가비구가 탑을 숭배하는 것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불탑신앙은 출가비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감은사지를 비롯한 신라와 백제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탑과 금당의 배치는 불탑신앙이 확립된 이후에야 나타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고대 인도의 반구형 스투파가 지금과 같은 탑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때문에 반구형이 주는 분묘의 느낌이 엷어지고 ‘붓다의 몸’이라는 상징성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또한 높아진 기단 부분과 상륜부에 남은 스투파 형식 때문에 동아시아의 목탑은 우주적 원이나 만다라라는 수평적인 조형성보다 누적적이고 상승적인 조형성이 강조되어 신앙의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
우리나라 석탑은 복잡하고 누적적인 다층 구조의 중국 목탑 형식을 단순화시켜 상승감과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발전한다.
ο 고유섭과 야나기
일제강점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일본 지식인 한 사람이 있었다.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고 석굴암의 부조에 감동하고 조선의 막사발을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상찬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정책과 선진 문명에 기죽어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감로수와 다름이 없었다. 1916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는 염상섭을 비롯한 폐허파 동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선의 벗’을 자처했으며, 198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야나기 무네요시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날까지 야나기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 훈장 수여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지만, 조선 예술에 대한 그의 평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1916년 조선 여행에서 만난 조선 시대 다완(茶碗)에서 민예론의 근거가 되는 미의식을 발견하고 1922년 〈이조 도자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조선 예술을 ‘민예’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로부터 조선 예술을 해석하는 관점은 모두 야나기에게 기대게 된다. “나는 조선의 역사가 고뇌의 역사이며, 예술의 미가 비애의 미인 것을 말했다. [······] 그들은 그들의 쓸쓸함을 고백하는 벗을 미의 세계에서 구했다. [······] 의지할 데 없는 쓸쓸한 마음을 전하는 데 눈물겨운 선보다 더 어울리는 길은 없을 것이다. [······] 비애의 미는 마음을 누르는 미가 아닌가. 그 미만큼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야나기가 조선의 미를 선의 미이며 비애의 미라고 정의한 것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타자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을 객체화하고 타자화했다. 비애미는 조선 예술, 나아가 조선의 역사와 민족을 이해하는 핵심어로 확립되어 오랫동안 조선인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고유섭은 한국미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해 한국미의 특징을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비정제성’, ‘적조미’, ‘적요한 유모어’, ‘어른 같은 아해’, ‘비균제성’, ‘무관심성’, ‘구수한 큰 맛’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야나기의 비애미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야나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한국미를 통시적으로 단일한 것으로 상정할 뿐 아니라 오로지 미감이나 형식적 특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야나기의 비애미론에 반대했던 고유섭 등이 야나기의 민예론을 수용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성주괴공 :: 세계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인 성겁(成劫), 머무르는 기간인 주겁(住劫), 파괴되어 가는 기간인 괴겁(壞劫), 파괴되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인 공겁(空劫)을 말함.
[네이버 지식백과] 성주괴공 [成住壞空]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시공사)
시간과 연꽃
ο 처염상정의 꽃

▶ 연꽃 –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수행자처럼 연꽃은 맑고 고귀한 꽃이며 물방울이 연잎에 스며들지 않고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악행이 수행자들의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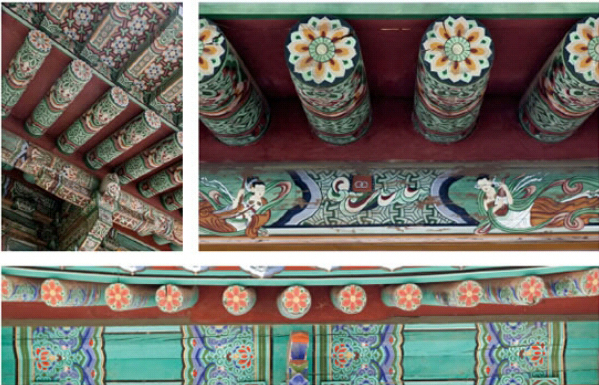
▶ 봉정사(위), 순천 송광사(아래)의 연꽃 문양 – 연꽃은 무던히도 겸손한 꽃이다. 연꽆은 그 자체로 화려한 조명을 받기보다 불상을 모시는 좌대로 기와나 창살의 문양으로 몸을 낮추어 다른 것들을 빛나게 한다.
영취산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설법하던 붓다가 문득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다. 창조주 브라흐마가 우주를 창조했던 곳이며 혼돈의 물 밑에서 잠자는 영원한 정령인 나라야나(nārāyaṇa)의 배꼽에서 태어난 꽃으로 신성시되었으나,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는 이 꽃을 붓다가 들어 보인 뜻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만 붓다의 뜻을 알고 미소로 화답하였으니 그가 바로 마하가섭이다. ‘염화미소’의 에피소드에서부터 연꽃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다.
연꽃에 깃든 불교적인 의미는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미묘한 향기를 담고 있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꽃,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화과동시(花果同時)의 꽃, 그래서 중생과 붓다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실상’을 상징하는 꽃이며, 극락세계의 연못에 피어 있는 즐거움의 꽃이다.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수행자처럼 맑고 고귀한 꽃이며 물방울이 연잎에 스며들지 않고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악행이 수행자들의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 연꽃의 향기가 세상을 가득 채우듯이 고결한 인품은 세상을 정화시킨다. 연꽃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듯이 수행자의 덕행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덕을 행하는 자는 부드럽고 연약한 연꽃 줄기가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도 항상 올곧다.
천하의 명문, 「애련설」을 지은 송대 신유학자 주돈이(周敦頤)는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겨 깨끗하되 요염하지 않고, 속은 통하고 밖은 곧으며, 덩굴도 뻗지 않고 가지도 치지 않으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 있지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연꽃의 덕을 칭송한다.
불교미술에서 연꽃은 불상의 대좌나 광배, 그리고 석탑이나 부도에 새겨 놓는 문양으로 사용된다. 불단과 천장에도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고 기와나 창살, 벽돌까지도 연꽃의 문양이 사용된다.
연꽃은 그 자체로 화려한 조명을 받기보다 불상을 모시는 좌대로서, 또는 석등을 받치는 받침대로서 그렇게 몸을 낮추어 다른 것들을 빛나게 한다.
붓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을 때에도 연꽃은 그저 붓다의 발밑에서 피어올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의 발을 받쳐 주었을 뿐, 그 존재를 자랑하지 않았다.
ο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 단원 김홍도의 하화청정도 – 시들어가는 연잎과 화사한 연꽃의 대비,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로 마주보는 고추잠자리의 모습에서 여름날의 상쾌함이 느껴진다.

▶ 운문사 작압전 석조여래좌상 – 기원 후 1세기부터 불상의 좌대나 광배에 조각된 연꽃무늬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 탄생과 파고의 과정을 상징한다. 뭇 중생들을 품어 주고 아픔을 달래 주느라 코가 깎이고 세월의 풍화에 얼굴도 뭉그러졌지만, 연꽃 좌대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운문사 석조여래좌상의 편안하고 소박한 모습은 변치 않는 고불, 그 자체이다.
『마지마니카야』에는 붓다 탄생의 모습을 “여래는 태어나자마자 발을 땅에 딛고 북쪽을 향해서 흰색 양산을 드리운 채 일곱 걸음을 걸었다. 일체제방을 바라보고 황소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선한 자, 가장 연장자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니, 이후로 나에게 새로운 생은 없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붓다가 내디딘 일곱 걸음을 우주의 일곱 행성에 해당하는 일곱 층을 가로지르는 상징적 행위라고 해석한다. 일곱 층의 우주를 가로질러 세계의 정상에 도달한 붓다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자이며 그것은 공간적으로 세계를 초월함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붓다는 시간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우주의 정상에서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은 가장 오래된 곳이며 이곳에 선 붓다는 태초의 존재로서 ‘나는 가장 연장자’라고 외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의 탄생 이전의 장소에 선 붓다는 더 이상 윤회의 세상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 생이 나의 마지막 생’이라고 사자후를 한 것이다.
붓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피어올랐던 연꽃은 탄생의 의미와 동시에 청정하고 거룩한 수행을 상징한다.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붓다 또한 이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서정주 시인은 말한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그것도 엊그제가 아니라 한두 철 전에 만나고 가는 것처럼, 섭섭하지만 아주 조금만 섭섭하라고.
6. 공간 소통의 미학

▶ 해인사 일주문 – 성과 속의 경계인 일주문 옆에 최평곤 작가의 작품 ‘내가 아닌 나’가 섰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틈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조형물이 또 하나 들어 있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에서 ‘참 나’의 의미를 묻는다.
자연과 소통하는 사찰
ο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이유

▶ 순천 송광사 불이문 – 일반적으로 불이문은 일주문, 사천왕문과 일렬로 배치되어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한다. 송광사 불이문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들어가는 작은 문으로, 수행자의 맑고 조촐한 기품을 느낄 수 있다.
사실 ‘템플스테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서양에서 ‘템플(temple)’은 신전을 말한다. 서양의 신전은 그야말로 신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신전을 지키는 사람조차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직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성소 외부의 별채에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서양에서 불가능한 템플스테이가 한국 불교에서 가능한 것은 사찰 공간의 의미와 기능이 서양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성과 속이 완벽하게 분리된 서양 건축과 달리, 동아시아 불교의 사찰 건축에서 성과 속의 공간은 기능적으로 중첩되고 통일되어 있다.
사찰은 불보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찰 건축은 서양처럼 폐쇄적이고 분리된 성소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소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가람의 어원인 ‘상가라마Samghārāma’는 수행자들의 모임인 ‘상가Samghā’와 거주처를 뜻하는 ‘아라마arāma(원림)’를 합친 용어로서, 교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이 모여 사는 곳을 가리킨다. 고타마 붓다의 재세시 중인도 마가다국 가란타 장자가 기증한 원림에 빔비사라 왕이 오두막 60동을 건축하여 만든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 역시 겨우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조촐한 건물에 불과했다. 원래 사찰은 대도시 주변의 숲이 있는 동산에 위치했으며 인도는 열대우림 기후 때문에 수행자들이 탁발과 유행을 할 수 없을 때 수행을 위한 안거 제도가 정착하면서 정진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일 년 내내 상주하는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수행 공간의 성격을 잃지 않았다.
적정처에서의 수행은 대부분 개인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굳이 사원을 건립할 필요가 없었으나, 선종 수행은 조사(祖師)를 중심으로 모인 사원 공동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중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장소, 즉 사찰이 필요했다.
ο 절에 산을 담다

▶ 여수 흥국사 원통보전 – 절터는 땅의 기운이 넘치고 맑고 안정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자연의 힘을 모아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성을 맑게 하여 선 수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풍수지리설은 특히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구산선문 중 여덟 개의 산문이 중국의 풍수지리설이 유포된 강서지방에서 유학한 선승에 의해 개창되었다는 사실은 선종이 풍수지리설의 유행에 일조하였다는 학설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한다. 중국에서는 육조 혜능의 시대에 강서지방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당시 중국 사찰이 풍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당나라를 유학하고 돌아온 신라의 선승들은 각자 산문을 개창할 때 풍수 원리에 따라 터를 선정하였다.
선종과 더불어 풍수지리설이 유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회 분위기와 지지 기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 산문은 지방 교화의 중심지이자 지방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풍수지리설은 그 수용 계층인 호족 세력들에게 진골 귀족들의 지역적 폐쇄성에 반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지방 호족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거지를 명당이라고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독립적 세력 형성을 합리화했다. 이처럼 적정처에서 수행하는 선종 수행의 전통과 풍수지리설의 영향, 그리고 선종의 지지 세력인 호족의 지방분권적 성격 때문에 선종 사찰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선종 사찰은 종교적 상징의 완전성이나 성스러움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종교적 진리가 그 아름다움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선종에 이르러 자연은 종교적 상징성이나 도덕적 비유를 완전히 떨쳐 버리고 순수하게 현상적인 것이 되었다.
자연은 원시 신앙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법적 힘의 상징이었으며, 유가에서는 『논어』의 “지혜로운 삶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처럼 덕의 유비(諭比)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종에서 자연은 주술적 괴력의 존재도, 덕의 유비로서 도덕에 대한 예시도 아닌 순수 현상이 된다.
선종 사찰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수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의 인연을 끊는다거나 산수에 흐르는 기운을 모아 정신적 에너지로 바꾼다는 종교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선적인 표현의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감수 작용을 통해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을 순수 현상으로 이해하여 세계를 바라본다. 객관적 실재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주관적 인식 능력에 의해 나타난 세계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정적 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空)한 것이다.
선종에서 자연은 순수하게 현상적인 것이지만, 그 현상은 현상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空)의 직관으로 변한다. 바로 현상 속에서 공을 직관할 수 있을 때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서 자연은 선적 깨달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되며, 미적 대상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서양 미학에서처럼 그 자체의 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연에 내재된 객관적 미에 의해 우리가 미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순수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공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미적 감수가 형성되며, 동시에 선적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시선일치(詩禪一致)’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선 수행에서 수행은 자연과 소통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깊어 가는 것, 그러므로 속의 공간을 그대로 성의 공간으로 바꾸는 힘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덧없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곳 없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 놓고 욕심도 벗어 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라하네.
- 나옹화상
텅 빈 절 마당에 깃든 상징
ο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구조

▶ 해인사 – 불이문을 지나면 절 마당에 발을 딛게 된다. 무심한 듯 정갈하게 정돈된 절 마당에는 종교적 상징성이 깃들어 있다. 하루 수백 번을 지나다니더라도 수행자는 대웅전을 향해 절을 하고 신심 깊은 사람들은 탑을 돌며 소언을 빈다.

▶ 미황사 괘불대(좌), 봉정사 석축(우) - 절마당에는 탑이나 괘불대 같은 석조 구조물이 세워진 경우도 있지만 그냥 텅 빈 공간 한쪽 구석에 자연석이 세워져 있거나 다년생 풀이 자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불교 건축은 초월적 존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공간, 수행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불교 건축 역시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하여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적멸의 세계로 상승하는 불교적 우주관을 가장 잘 표현한 상징적인 건축물로 보르부두르 대탑이 대표적이다.
불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불상을 안치한 전각이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지만 법당 안팎의 여러 가지 구조물과 장식물들, 심지어 진입 공간과 일주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문, 종교적 승화를 표상하는 계단까지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절 마당은 유럽식의 중정처럼 사면의 담이나 벽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사면의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술한 공간이다. 그곳은 꽉 막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열린 공간이다. 이 텅 빈 장방형의 공간은 그야말로 ‘공’의 상징이면서 실제로 마음을 비우고 청정하게 하는 ‘비움’의 장소이다.
야단법석 :: 본래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베풀기 위해 야외에 설치한 법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대신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던 모습에서 비롯되어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서로 다투고 떠들고 시끄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법석(法席)은 역시 설법을 베푸는 경건한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단법석을 떠는구나.”라고 할 때의 야단법석은 한자가 다릅니다. ‘惹端법석’이라고 쓰니까 한자+한글인 복합어인 셈이죠. 이때의 야단법석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사전에 따라서는 이때도 법석을 法席이라는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야단법석이란 표현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앞으로는 야단법석 떨지 말고 조심해 쓰자고요.
[네이버 지식백과] 야단법석 [野壇法席] - (들 야, 단 단, 법 법, 자리 석)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2010. 9. 15., 서해문집)
ο 자연의 풍경을 끌어들이다

▶ 영주 부석사 –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안양루 아래로 아스라이 사라져 가는 백두대간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사물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절 마당은 담이나 벽 같은 경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경계 너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절 마당은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담장 너머의 자연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건물 외부의 자연을 끌어들여 자신의 풍경으로 만드는 것을 ‘차경(借境)’이라고 한다. 차경을 위하여 대부분의 선종 사찰은 탁월한 조망을 갖는 지점에 조성되었다.
자연의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국 사찰은 바위와 나무, 심지어 마당의 모래까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일본 사찰의 고도로 정제된 정원을 거부하고 토종의 꽃과 풀이 자라는 소박하고 정감 있는 뜰에 만족한다.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한 것’, ‘원래 그러한 것’이다. 우주 만물은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변화하여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산수 자연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공이며 불성의 체현이기 때문에 적막하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선취(禪趣)를 띠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선종 사상은 자연을 감상하고 관조하는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산수는 세상의 속된 가치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청정하게 살면서 마음의 깊은 근원을 깨닫는 매개물이었다.
이처럼 선종 사찰은 종교적 상징물들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텅 빈 공간이 갖는 종교적 변형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의 매개로 삼아 다른 종교적 공간과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
수행의 공간, 승방
ο 수행과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

▶ 순천 선암사 승방 – 전통 사찰의 건축적 가치는 단청의 화려함이나 처마의 곡선미보다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승가 공동체와 그들의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의 아름다움은 외양보다 사람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힘에 있기 때문이다.

▶ 김천 수도암 –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자신의 물성을 과시하기보다 안과 밖을 소통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 건축물은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이기 보다 안과 밖을 다시 연결시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 봉정사 – 사찰 건축물은 대중스님들 사이의 위계를 강요하기보다 친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둥, 보, 도리로 이루어진 간의 구조 덕분에 사찰 건축의 내부 공간은 다의적이며 변용의 폭이 매우 넓다.
건축물은 나무나 돌, 시멘트,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물성을 갖는 사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에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텅 빈 공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건축물은 원래 하나였던 공간을 구분하여 안과 밖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내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구조화한다.
서양의 건축물들은 그 견고한 물성으로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안전하고 항구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과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처럼 견고한 요새와 같이 자연의 위협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건축물에서는 무엇보다 그 물성이 강조된다.
반면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자신의 물성을 과시하기보다 안과 밖을 소통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 건축물은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이기보다 안과 밖을 다시 연결시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보적인 존재로 화해시킨다.
불교는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생활을 위한 승원이 먼저 지어지고 나중에 예배용 건물인 탑과 금당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불교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이 없었으며 다른 나라로 전파된 뒤에도 그 나라의 세속 건축양식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경우 후한 말 불교가 처음 전해질 때 서역에서 온 스님들이 묵었던 곳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홍려시(鴻廬寺)였기 때문에 그 후 사찰을 지을 때 관청 양식으로 짓게 되었다. 관청을 의미하는 ‘시寺’가 사찰을 의미하는 ‘사(寺)’로 전용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찰 건축은 일반 건축과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초기에 금당은 불상을 봉안하는 ‘붓다의 집’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는 건물 외부에서 치러졌고 탑도 그 자체로 예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밀폐되어 있었다. 이런 특징을 이어받아 일본 사찰에서는 아직도 금당이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한국의 전통 사찰 건축은 종교적 상징성보다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다. 사찰 건축물은 법당이든 승방이든 부속 건물이든 큰 차이가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 내방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중정으로 연결된 공간은 일정 정도 외부인의 방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닫힌 공간이면서도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또한 예불 공간이나 그 밖의 다른 영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방객의 출입도 허용된다. 신도가 시주물을 전달하거나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승방을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생활과 수행을 엿볼 수 있다.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가 지적하듯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한 장소를 할애하는 것은 공간 및 존재 방식의 분배에 감성적인 단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닫힌 공간은 고독한 가운데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 삶을 통한 탁마를 위해 열린 공간 또한 필요하다. 한국 사찰의 건축구조는 이러한 승가 구성원의 모순된 요청을 훌륭하게 해결하여, 각자 자신에게 집중하여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탁마하고 경책하는 관계를 맺게 한다.
『율장』에는 스님들이 승방 안에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붓다는 출가자든 재가자든 사부대중이 자유롭고 격의 없이 소통하며 서로 지킴이가 될 때 승가의 청정이 유지되리라 판단하여 이 계율을 제정했던 것 같다.
기둥, 보, 도리로 이루어진 간(間)의 구조 덕분에 사찰 건축의 내부 공간은 다의적이며 변용의 폭이 매우 넓다. 간의 크기는 두 개의 기둥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며 건물의 크기도 간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 변한다.
간은 건물의 내부 공간을 단일한 단위로 구획한다. 따라서 내부 공간은 위계의 차이가 없는 단순하고 동질적인 공간성을 얻게 되는데,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무엇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법당인지, 선방인지, 개인 방사인지 결정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단을 설치하고 불상을 놓으면 불당이 되고, 바닥에 참선용 방석인 좌복을 깔면 선방이 되고, 발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 식당이 되고, 침구를 펼치면 침실이 된다. 최근 이처럼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옥의 장점이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대방은 내부 공간을 나누지 않고 그때그때 대중스님들이 모여 예불, 공양, 강학, 참선, 포살(布薩) , 자자(自恣)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인법당의 경우, 한 면에 불상을 놓거나 불화를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의례를 집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방은 완전히 텅 비어야 한다.
ο 공간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와 구조

▶ 순천 선암사 – 전통 한옥의 빗장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사람이 없는 빈집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다. 대문이 없어도 빗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옥에서 살려면 먼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공간구성은 전혀 다른 인간관계와 사회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전통 한옥은 대문을 안에서 잠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고 보면 전통 한옥의 빗장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사람이 없는 빈집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다. 옛날에는 집에 항상 사람이 있거나 집을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는 잠금장치가 필요 없었다. 대문이 없어도 빗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 옛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다.
반대로 현대식 잠금장치는 안에서도 잠글 수 있고 밖에서도 잠글 수 있다. 그것은 한옥 빗장과 달리 빈집을 잠그는 장치이다. 빈집을 잠근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뭔가 보호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다.